마감 전날 저녁 8시다. 내일이 마감인데 이제 막 칼럼의 첫 줄을 쓰기 시작했고 주제도 조금 전에야 정해졌다. 하루 종일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 전전긍긍하다가 솔직히 이번 달은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려니 정신적으로 격렬하게 피곤해졌고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순간, 교토의 '료안지'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정확히 말하면 료안지 안에 있는 가레산스이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이 든 것이다.

‘가레산스이’ 정원은 선종 불교의 영향을 받은 정원 양식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바위, 자갈, 이끼와 같은 요소만으로 구성된다. 정원의 전체적인 배경은 잘게 부순 흰 자갈이나 모래를 바닥에 고르게 깔고 갈퀴로 긁어내며 잔물결과 같은 표면을 만드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에 따라 극도로 정돈된 인상의 장면이 만들어진다. 몇 달 전의 칼럼에서 다루었던 마조렐 정원을 떠올려보면 같은 정원이라 해도 문화적 배경과 형성방식에 따라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의 정원은 교토에서 선종이 자리를 잡아가던 무로마치 시대에 형성되었다.
[이전 칼럼] ▶▶▶ 모로코의 햇살과 눈부신 파랑...이브 생 로랑이 잠든 마조렐 정원
도심에서는 넓은 정원을 만들기 어려운 여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돌, 자갈, 이끼만으로 세계를 추상화하여 불완전한 인간이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선종의 사유를 반영한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정원은 산과 바다 같은 자연, 더 나아가 불교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관념적으로 구현해낸 공간이 된다. 가레산스이 정원에 대한 설명해준 필자에게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바로 이 ‘관념을 형성한다’는 말이었다. 자연을 펼치는 방식이 아닌, 절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며 형성된 정원이 누군가에는 산, 누군가에게는 폭포, 누군가에게는 바다와 같이 보는 사람의 내면세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료안지의 석정은 가레산스이 정원을 대표하는 곳으로, 방장(승려, 특히 주지가 머무는 건물)에 연결되어 툇마루에 앉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로 25m, 세로 10m의 크지 않은 공간에 정갈하게 펼쳐진 흰 자갈 위로 15개의 바위가 작은 무리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 이 바위 주변은 이끼가, 이 이끼는 다시 파동과도 같은 무늬가 감싸고 있다. 이 정원은 ‘15개의 바위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특히 유명하다. 이는 완전한 것은 없다는 선종의 사유가 반영된 설계로 ‘해석’되지만, 명확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공간 제약에 따른 설계방식의 결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정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자 한다.
모래, 자갈, 바위, 이끼가 만들어내는 지나치게 단정한 산수화와 같은 공간,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 이것이 료안지의 가레산스이에 대해 필자가 느낀 인상이었다. 물론 료안지의 석정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공간에 대한 글을 쓰다 보면 더 설명하고 싶은 공간과 덜 설명하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이 정원은 그곳을 실제로 경험할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기분마저 든다.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지답게 료안지의 툇마루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앉은 후 가만히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 정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정원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다. 바위가 15개인지 14개인지는 알고 싶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그렇게 멍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몇 분 동안 잠이 들어있었다. 그러고 나서 뭔가 묘한 공허감을 느꼈던 것 또한 기억난다. 당시에 필자는 밤낮으로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무언가 극단적으로 비어있는 것을 마주하고서는 정신이 비워지며 긴장 상태가 풀렸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일상이 지나치게 빽빽하거나 긴장이 길게 이어질 때면 그때의 경험이 생각나곤 한다.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도 몇 년 전에 찍었던 정원의 사진을 다시 찾아보았는데, 그때의 기분이 다시 상기되며 마감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긴장이 점점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해야 할 일과 긴장이 교차하는 이 혼잡한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텅 비어있는 것을 마주하는 경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배세연 한양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3 weeks ago
4
3 weeks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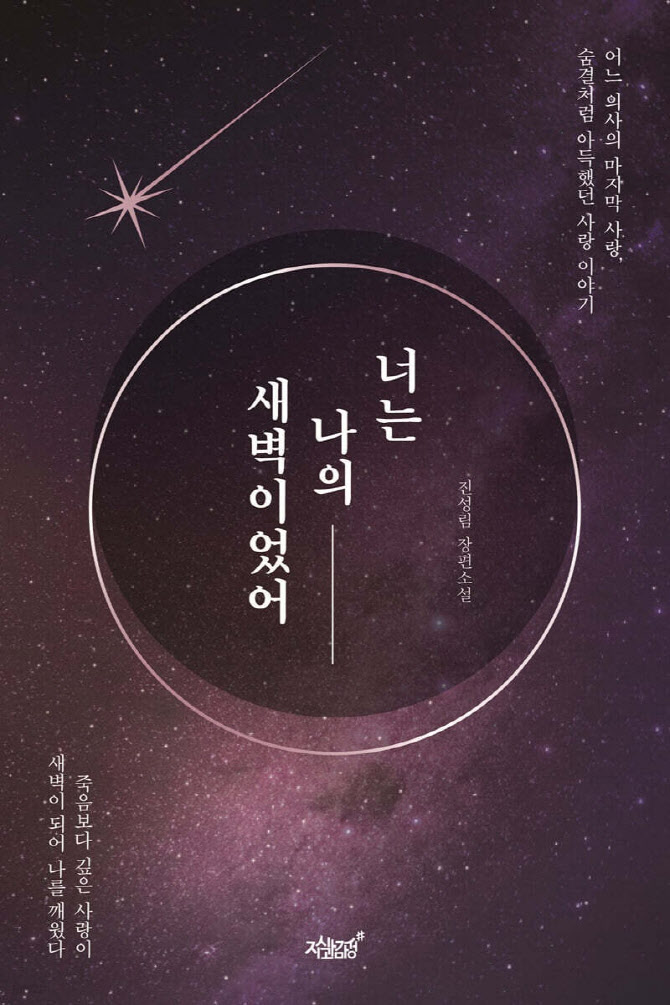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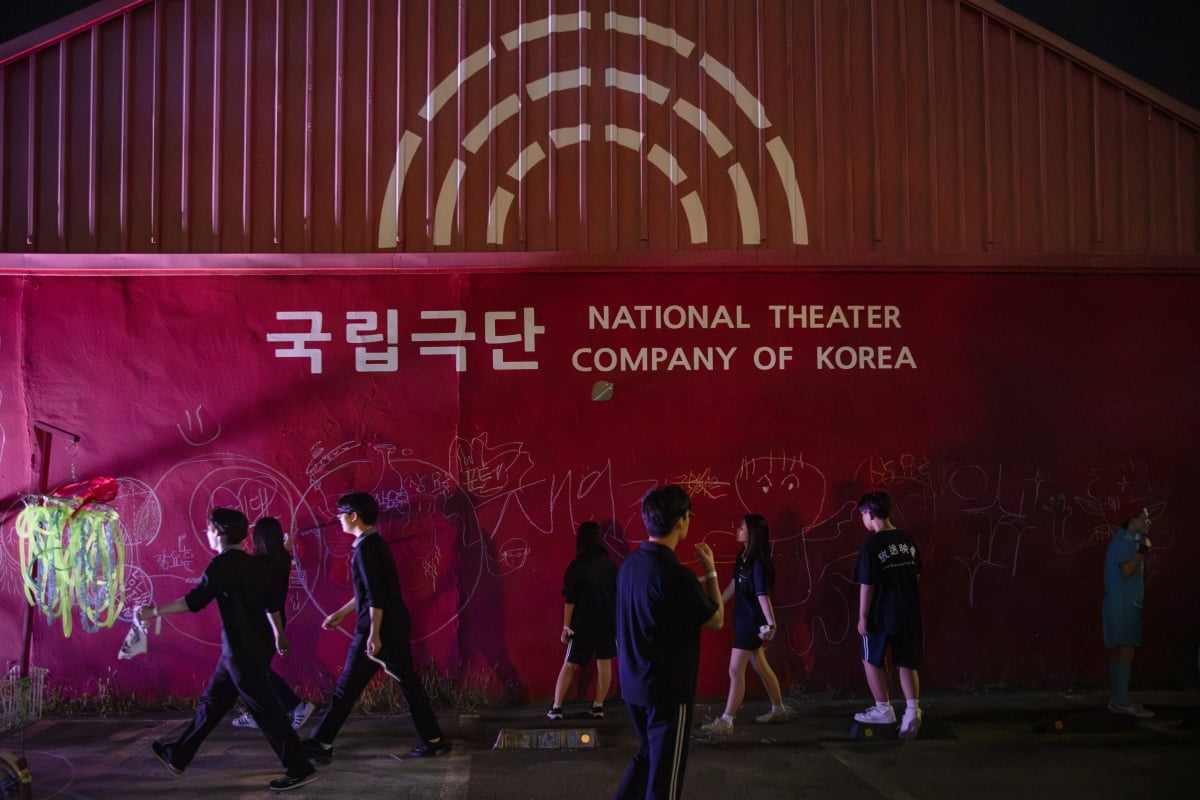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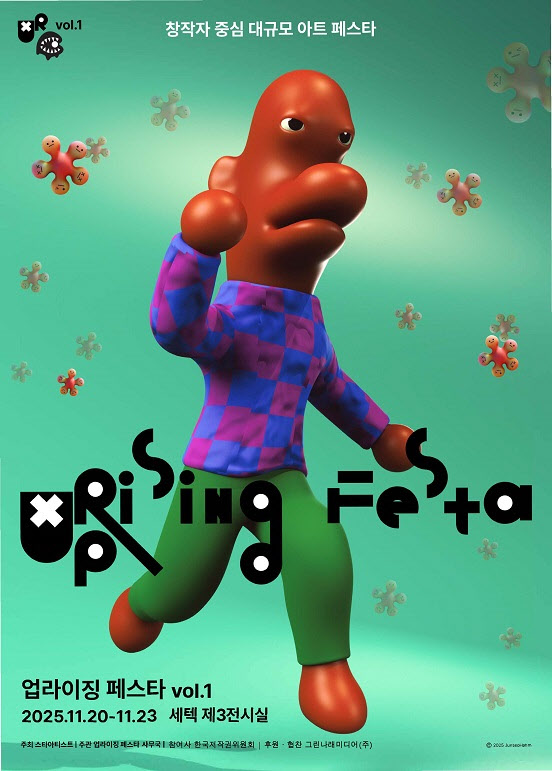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