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장으로 향하는 관객의 발길이 줄고 OTT 플랫폼의 거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극장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컬처웍스(옛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영화 산업은 관객 감소, 제작 편수 축소, 흥행작 부재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억 원에 불과했으며, 메가박스는 13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는 각각 6개, 10개의 지점을 폐쇄했다. 이번 MOU 체결은 이러한 침체 국면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롯데그룹과 중앙그룹은 지난 8일 영화관 운영 및 영화 투자·배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합작 법인을 설립해 공동 경영을 진행하고, 신규 투자 유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양사의 스크린 수는 총 1682개로 업계 1위인 CJ CGV(1345개)를 넘어 양강 구도를 이루게 된다. 이들은 각사의 운영 노하우,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 투자와 비용을 줄여 수익성 개선을 노릴거란 관측이다.
롯데와 메가박스는 특별관 확대,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재원을 시설·기술에 재투자해 관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양사는 IP 확보와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협업 시너지를 기대하며, 이번 합병이 한국 영화 산업 회복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그룹 측은 "차별화된 상영 환경 구축, 안정적인 한국 영화시장 투자,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합병의 주요 골자"라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사업 경쟁력과 재무 체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콘텐츠 다양성 확대와 관객 서비스 개선 등, 영화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업계에서는 "합병, 아직 갈 길 멀다…구조조정은 불가피"

국내 극장 산업이 팬데믹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극장 관객 수는 약 1억 200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관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영화의 부진이 두드러지며 극장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관객 감소의 원인으로 OTT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 높은 영화 관람 비용, 중간 규모 및 다양성 영화의 약화 등을 꼽고 있다. 대형 블록버스터 중심의 라인업이 반복되며 관객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이는 결국 관객의 극장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추진하며 침체된 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 시너지 창출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으나, 브랜드 통합, 중복 지점 정리, 투자 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을 계기로 시장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영화 관계자는 "MOU는 시작일 뿐, 공정위 심사와 각종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합병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A 배급사 관계자는 "현재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공격적인 확장이라기보다 시장을 효율화해보자는 목적성이 더 크게 느껴진다. 중복 극장 정리 등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좌석 판매가 원활한 것도 아니기에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며 관객 입장에선 좋을 것 같다. 다만 투자배급사 입장에선 창구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라며 "투자나 배급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 제작사 관계자는 "적자 상태로 버텨온 두 회사의 이러한 전략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며 "적자 상태에선 투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빙과 웨이브 합병에도 진통이 있지 않으냐. 현실화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투자는 위축될 것"이라며 "극장 노후화, 콘텐츠 질 저하, 고용 문제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CGV 측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전략이다. 황재현 CJ CGV 전략지원담당은 "스크린 수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선택"이라며 "특별관 경쟁력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GV는 포디엑스(4DX), 스크린X 등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통해 베트남, 튀르키예 등 해외 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CJ CGV는 국내 극장 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 효율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CJ CGV는 특별관을 내세우면서 극장의 경험 차별화로 성장 동력 확보할 계획"이라며 "영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등을 스크린으로 단체 관람하는 문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CJ CGV가 산업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극장 업계는 침체 탈출을 위해 '홀드백' 제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일정 기간 상영된 후 IPTV나 OTT로 넘어가는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에선 최소 6개월의 홀드백은 확보돼야 OTT와 상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송중기 주연의 영화 '보고타'가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OTT에서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한 관계자는 "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영화들이 많다 보니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코로나 이후 홀드백 질서가 붕괴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극장에서 최대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는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 그 후에 IPTV나 OTT로 넘어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관객의 평가를 받는 과정이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각 플랫폼별로 관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한다면 결국 관객을 위한 홀드백이 되고 이런 과정이 지켜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영화 산업도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투배사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 투자사 관계자는 "'파묘'와 같이 생명력이 긴 영화들은 두 달, 석 달 걸어놔도 계속 관객들이 들어온다. 하지만 흥행이 안 되는 영화들은 생명력이 짧아서 홀드백이 막혀버리면 2차 판권 판매 시기도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홀드백을 법제화하려면 영화마다 최소 스크린 수를 보장 등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4 hours ago
1
4 hours ago
1

![[부고]강호동(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씨 빙모상](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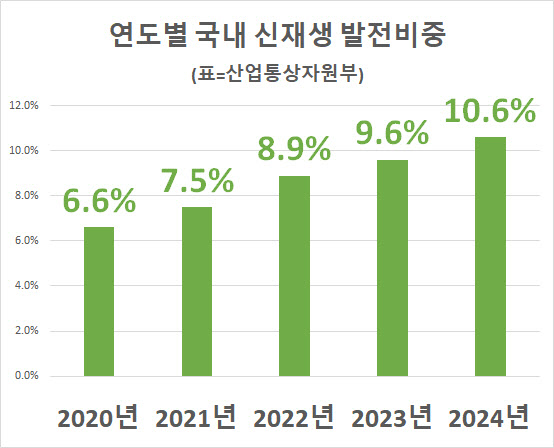

![[세종만사] 조기대선에 '속도조절' 들어간 부처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8/rcv.YNA.20250508.PYH2025050812040001300_P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