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그가 먼저였다.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튀르키예 소설가 오르한 파묵(72)은 질문지에도 없었던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파묵은 신간 ‘먼 산의 기억’(민음사) 출간을 계기로 국내 언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 75%가 대통령에게 화를 내고 있다”며 “그들의 바람에 존경을 표한다. 원하는 것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 튀르키예 최초로 2006년 노벨문학상을 품에 안은 소설가 오르한 파묵이 14년간 써내려간 내밀한 ‘그림일기’를 묶어 최근 ‘먼 산의 기억’을 펴냈다. (사진=민음사 제공). |
틈새 시간 쓰고 그린 14년 치 ‘그림일기’
에세이 ‘먼 산의 기억’은 파묵이 늘 들고 다니는 몰스킨(브랜드명) 수첩에 14년간 쓴 일기와 그림을 한 권으로 엮은 책이다. 일종의 ‘그림 일기장’인 셈이다. 책에는 여행하며 겪은 일, 가족에 관한 일화, 글 쓰는 과정, 고국과의 복잡한 관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어린 시절 화가를 꿈꿨던 그는 스물두 살에 꿈을 접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수첩에 그림을 그렸다. 파묵은 “7살 때 어머니가 일기장을 선물해 준 후부터 일기를 써 왔다. 몰스킨에 쓰기 시작한 것은 노벨상 수상 이후”라면서 “일기는 가장 비밀스러운 나만의 세계이자,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쓰다 보면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밝혔다.
손바닥만 한 공책에 쓰는 이유를 묻자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기차를 타고 갈 때, 식사할 때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 아내와 외출을 하려고 할 때, 그녀를 기다리면서도 기록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고 묻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틈새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벨문학상 수상 큰 의미 없어…한강에겐 축하 건네
파묵은 1979년 첫 소설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을 펴낸 후 대표작인 ‘내 이름은 빨강’(1998), ‘눈’(2002), ‘순수 박물관’(2008) 등을 써내며 2006년 당시 54세의 젊은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쉼 없이 하루 8~10시간 매일 글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이 작가로서 어떤 큰 의미를 갖진 않고 “약간의 책임감”이 있다며 “물론 상을 받은 후 새로운 독자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게는 “‘채식주의자’(창비)를 읽었다. 터키어로 번역된 그의 작품들을 구입해 놓았고, 곧 읽을 것”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파묵은 튀르키예의 권위적인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작가로도 잘 알려졌다. 그는 극우 세력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파묵은 “나도 두려울 때가 있다”며 “튀르키예 대통령이 많은 작가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아마도 노벨문학상이 나를 보호하는 것도 같다”고도 전했다.
파묵은 장 자크 루소의 ‘고백록’, 몽테뉴의 ‘수상록’ 등을 언급하며 ‘일기’라는 장르의 전통과 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내밀한 기록인 그림일기를 책으로 펴낸 것에 대해 망설임과 후회에도 옛 작가들을 보고 용기를 냈다며 “서양 문학, 프랑스 문학의 바탕에 이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도 이 전통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했다.
현재 준비하는 소설의 제목은 ‘첫사랑’. 꽤 많이 썼는데 6개월 정도 멈췄다가 쓰고, 다시 다듬기를 반복 중이라며 한국 독자들과 만나기 위해 끝맺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차기작을 소개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기 어려운 동시대 독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공책과 홀로 남으세요. 아무에게도 보여 주지 말고 부끄럽더라도 계속 쓰십시오. 글을 쓰는 동안 서서히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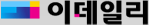 5 days ago
7
5 days ago
7
![[카드뉴스] 2024년 12월 23일 오늘의 운세](https://image.edaily.co.kr/snaptime/snt20241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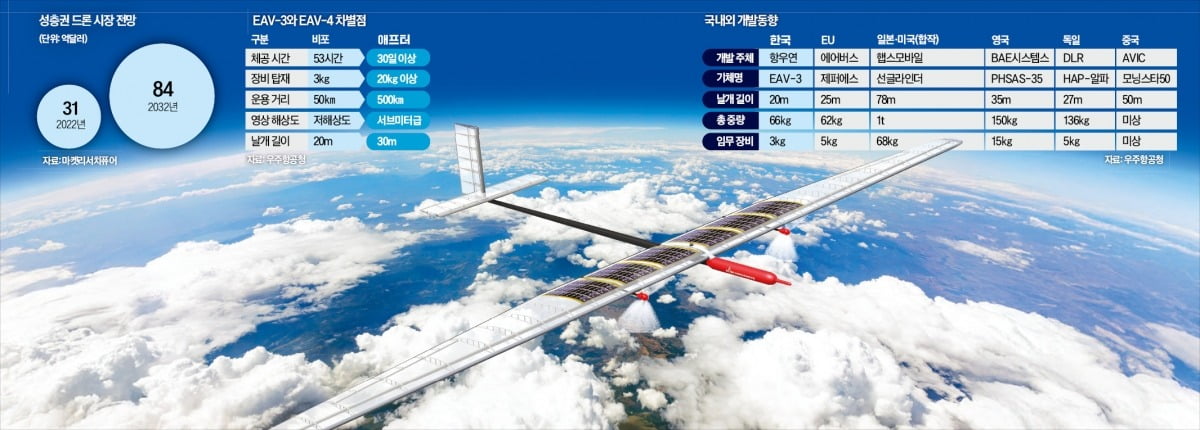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