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의 자유와 무력감 교차하는 이머시브 연극
AI 시대, 인간 아닌 존재의 감각을 묻다
![‘디 임플로이’ 공연 중 무대 위에 마련된 함선 구조 내에서 배우들이 식사를 하는 연기를 펼치고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5]](https://pimg.mk.co.kr/news/cms/202510/27/news-p.v1.20251027.c933c744928448ba977e59af0c66e26e_P1.jpg)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초청작 ‘디 임플로이(The Employees)’는 관객의 끊임없는 불만족을 전제로 한 이머시브 SF 연극이다. 관객은 자유롭게 무대 위 우주선을 돌아다니며 관람하지만, 끝내 중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야기의 주변만을 배회하게 된다.
덴마크 작가 올가 라븐(Olga Ravn)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탐색하는 멀티미디어 SF 연극이다. 지구가 파괴된 뒤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밤낮없이 함께 근무하는 우주선 ‘6000호’를 배경으로, AI 휴머노이드 시대 인간성의 의미를 되묻는다.
연출은 폴란드 출신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Łukasz Twarkowski). 그는 영상·음향·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무대로 유럽 연극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다.
‘디 임플로이’는 박진감 넘치는 영상 오프닝으로 시작된다. 마치 마틴 스코세이지 영화의 트래킹숏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고한다.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배우를 촬영하는 두 대의 카메라 영상은 컷 전환과 줌 인·줌 아웃을 거치며 현장에서 화려하게 편집돼 송출된다.
그러나 이후 전개는 관객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다. 이야기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흐른다. 관객은 객석을 벗어나 무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자유는 곧 무력감으로 바뀐다. 함선은 칸막이에 가려져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미로처럼 얽힌 구조는 시야를 단절시킨다. 결국 관객은 다시 객석으로 돌아와 스크린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만, 제한된 시야각의 영상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객석에 앉아 있자니 무언가를 놓치는 듯하지만, 막상 돌아다녀보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연극 ‘디 임플로이’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자유롭게 무대위에 올라가 앉거나 걸어다니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구정근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10/27/news-p.v1.20251027.1f0ceb1a8b43482cbe7eeaee32461992_P1.png)
배우들은 함선의 안팎을 오가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언어는 결론이나 결단에 이르지 않는다. 대화는 과거의 회상이나 현 상황의 서술에 머물며, 극이 진전될 듯하면 굉음의 사이렌과 함께 인터미션이 시작된다. 관객은 다시 객석으로 밀려나듯 돌아온다.
이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다. 작품은 이머시브 씨어터의 단점이라 할 만한 요소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관객은 무언가를 계속 놓치며 전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관람의 최선’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관객이 느끼는 항시적 불만족은 곧 극 속 사이보그들의 세계를 반영한다. 그들은 열화된 대체물만 섭취하며 원본을 상상해볼 뿐이다. 인공의 냄새와 인공의 맛, 의미 없는 항해 속에서 ‘지구’를 그리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극 중 한 인물은 말한다. “멋진 노래를 들으면 잠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건, 무한히 연기되는 클라이맥스.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시키는 이 서사는 관객의 기대를 무너뜨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의 허무를 그린다.
![‘디 임플로이’ 무대 위에서 두 배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극 중에서사이보그 역을 맡은 배우들은 지구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낸다. [구정근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10/27/news-p.v1.20251027.91911f27c031429a81540ec350ae14eb_P1.jpeg)
작품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상호작용하는 비인간 객체들의 주체성도 드러낸다. 초반부에 유일한 인간 객체에 의해 강제로 종료되는 등 수난을 겪던 사이보그들은 이후 인간에 대한 반란을 모의하기도 한다. 사이보그와 인간의 위계는 극이 진행될수록 점차 흐릿해진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연출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이머시브 구조이지만 관객, 즉 인간의 개입은 배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사이보그 간 대사는 점점 사라지고, 대화는 자막으로만 전달된다. 객석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극의 흐름은 언어가 불필요해진 세계를 암시한다.
‘디 임플로이’는 관객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연극이다. 그러나 그 소외 속에서 인간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닌 미래 세계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난다. 극은 최근 주목받는 이머시브 씨어터의 활용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단순히 ‘체험형 공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연출의도와 극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승 집착 독 됐다" 마음 다잡은 장희민... 시즌 최종전 불꽃 튀는 선두 경쟁 [서귀포 현장]](https://thumb.mtstarnews.com/21/2025/11/2025110821150851420_1.jpg)
![멀리선 희극, 가까이에선 비극 '김 부장 이야기'[김노을의 선셋노트]](https://thumb.mtstarnews.com/21/2025/11/2025110715213192160_1.jpg)
![오은영, 돌아가신 父 생각에 울컥.."마지막 순간까지 힘 주셨다"[불후의 명곡][★밤TV]](https://thumb.mtstarnews.com/21/2025/11/2025110819541956873_1.jpg)
![배우·예능·CEO..송지효의 도전 "모든 일에 진심, 열심히 뛰어다닐 것"[★FULL인터뷰]](https://thumb.mtstarnews.com/21/2025/11/2025110714074281994_1.jpg)

![방송 6년째 '놀뭐', 이이경 철퇴까지..'유라인 안정화'는 언제쯤?[★FOCUS]](https://thumb.mtstarnews.com/21/2025/11/2025110716470711781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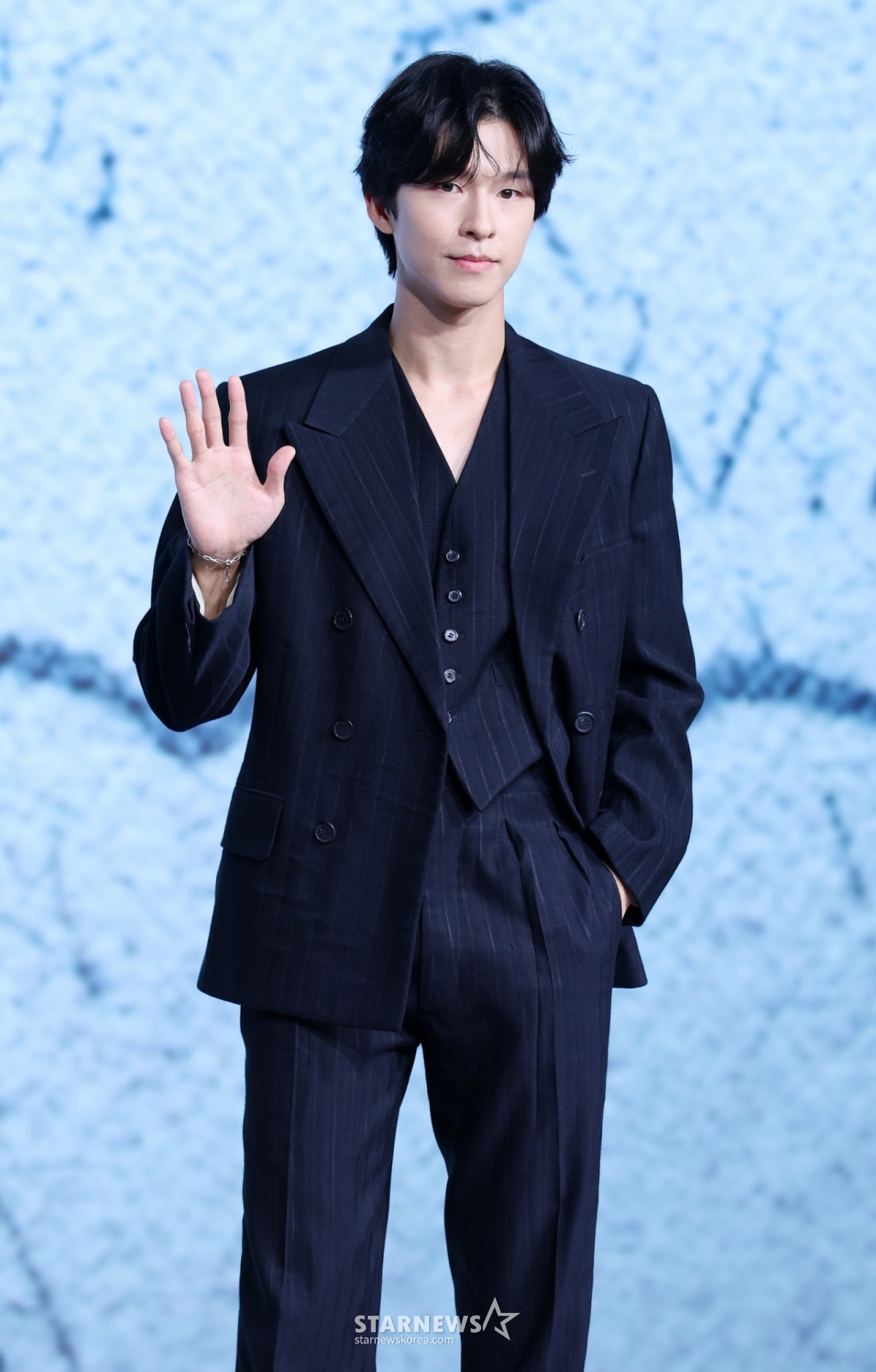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