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공공기여로 내놓는 시설의 구체적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비축’해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사업은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데다 초기 단계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확정해 놓을 경우 시대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합리적인 공공기여 비축 관리·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이달 착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공공을 위해 내놓는 제도다. 10년 전 공공기여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됐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서울 전역에서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공공기여로 공급됐다. 하지만 공공기여 계획 결정 시점부터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정비사업은 통상 10년 남짓 소요된다. 사전협상이나 역세권청년주택 프로젝트도 각각 8년, 4년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준공 시점에 어떤 유형의 공공시설이 필요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정부에서 관련 시설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 전에 AI 관련 교육시설 등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걸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 정책이나 시책 등에 따라 특정 유형의 시설을 급하게 늘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당초 어린이시설을 공공기여로 확충하려 계획했는데, 막상 준공 시점 때 노인복지시설 등이 더 필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공공기여분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비축해 놓는다면 이 같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거지역 내 수요는 시간이 흘러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도심 개발 사업장 등에서 비축 제도가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10년 정도 흐른 만큼 그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할 점을 살펴보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기여 비축 구상은 시의성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주민 기피 시설이 기부채납 시설로 뒤늦게 결정될 경우 사업이 중간에 삐그덕거릴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이용률이 낮은 시설의 현황 실태 조사에도 나선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 day ago
4
1 day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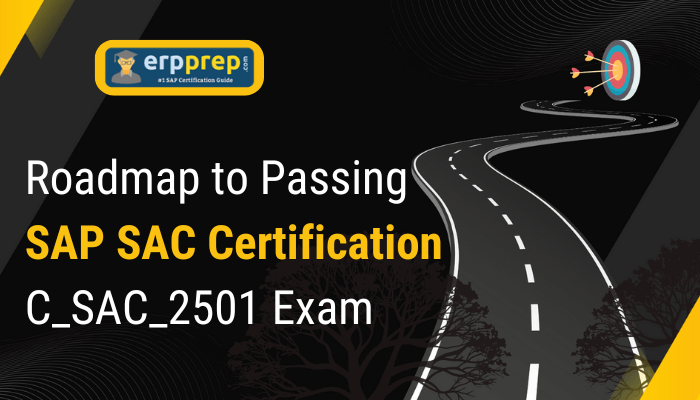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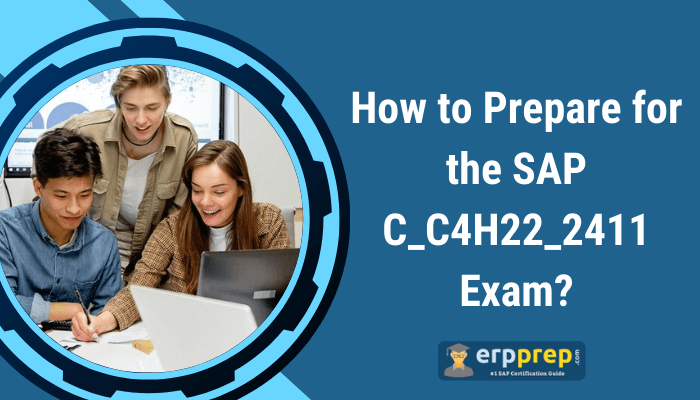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