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네 살 의대반' 광풍 멈추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9673977.1.jpg)
요즘 ‘네 살 의대반’ 같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케팅 용어가 낯설지 않다. 인생 진로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후 다양한 경험을 거쳐 결정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가 마치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특히 최근 입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의대 쏠림이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제히 의대를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를 단순히 개인적 선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국가 차원의 명확한 미래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니, 개인은 자연스럽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
과거에는 다양한 분야로 인재들이 진출했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경제학, 법학, 물리학, 화학, 전자공학, 의학 등 각기 다른 분야로 학생들이 나뉘어 진학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던 시절이지만, 사회에는 꿈과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때로는 비현실적일지라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며 미래를 논의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현실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경제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이 구조조정의 첫 대상이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이 단축되는 등 R&D 인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비전보다 생존’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경험이 부모 세대를 거쳐 자녀 세대에까지 전해지면서 학습됐다. 이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안정적인 전문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다.
논어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사람마다 즐기며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각기 다르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와 기업은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보니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행사 때마다 낭독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서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지만, 정작 어떤 대한민국이 되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G2 국가로 성장하겠다’ 같은 분명한 국가적 비전이 필요하다. 미래를 향한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days ago
7
2 days ago
7
![[한경에세이] 현장에 디테일이 있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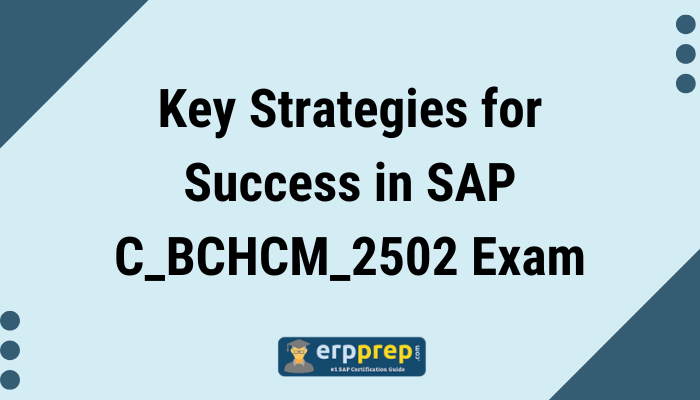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