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박사’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학부 석좌교수는 서울대 동물학과 출신이다. 최 교수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에는 식물학과와 미생물학과가 따로 있었다. 최 교수는 유학 준비 중 동물학과, 식물학과라는 명칭을 쓰는 대학이 극소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천자칼럼] 대학들의 학과명 간판갈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40012810.1.jpg)
동물학과라는 이름이 너무도 싫었다는 그는 동물학과는 분자생물학과, 식물학과는 환경생물학과로 바꾸자는 제안서를 만들어 지도교수인 조완규 자연대학장을 찾아갔다. 학과명 변경은 그때 성사되지 않았지만 조 학장이 서울대 총장이 된 1990년대 초 이뤄졌다. 동물학과는 분자생물학과로 개명했지만, 식물학과는 생물학 전공의 모과가 되겠다는 욕심에 환경생물학과 대신 생물학과를 택했다. 자연대 입시 성적 최하위였던 동물학과는 분자생물학과로 이름 하나 바꾼 덕에 단박에 물리·화학과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지만, 반대로 생물학과는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박혀 최하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사회 흐름에 맞춰 대학 학과명도 진화한다. 학과명만 잘 바꿔도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 신소재공학과로 통합되기 전 연세대 세라믹공학과의 전신은 요업공학과였다. 이 역시 학과명 변경 하나로 공대 꼴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설립 이후 이름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채광학과에서 광산학과로, 이후 자원공학과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한양대 유기나노공학과(전신은 무기재료공학과)처럼 개명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요즘 대학 학과명의 유행어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전국 대학 AI 관련 학과는 2020년 9개에서 지난해 146개로, 학생 수는 690명에서 1만4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름만 AI일뿐 실상은 AI와 거리가 먼 사례가 수두룩하다. 물류통계학과에서 AI융합학부로, 항공IT운항학과에서 AI컴퓨터공학과로 간판 갈이만 하는 식이다. 첨단 분야로 포장해 정원 확대나 정부 지원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다.
AI 시대 대학들도 생존전략으로 학과 간판을 바꿔다는 것이겠지만, 학생들 입에서 속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윤성민 수석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

 3 days ago
3
3 days ago
3
![[아르떼 칼럼] 현대미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인사] 한국환경공단](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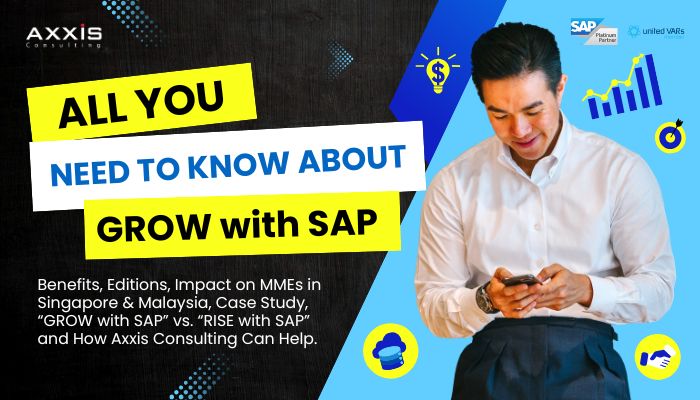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