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제 이후 1천곳 생겼지만
쿠팡 공세에 경쟁력 떨어져
북콘서트 등 부대행사로 버텨
정부 지원도 삭감돼 '이중고'

서울 경복궁 옆 서촌 '책방 오늘,' 문 앞. 젊은 커플부터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장년층까지 10여 명이 줄을 서 있다. 20분쯤 기다려 들어간 3평 남짓한 작은 서점 안엔 피아노와 전화부스가 있고, 소설과 시 등 단행본이 서가와 매대에 여유 있게 놓여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운영했던 독립서점답게 손님들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의 소설을 집어 들어 계산대로 향한다. 한 달여의 휴식기를 거쳐 지난달 13일부터 다시 문을 연 이 서점은 웨이팅이 기본인 관광명소가 됐다. 일주일에 나흘(수·목·금·토요일), 그것도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만 운영한 영향도 없지 않다. 책방 관계자는 "한강 작가가 더 이상 서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서점의 도장이 찍힌 한강 책을 갖고 싶어 하는 독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이 다시 불을 지핀 독립책방 열풍이 거세다. 동네마다 작은 서점이 내뿜는 아늑하면서도 개성 있는 분위기에 2030세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독립서점은 전국에 1000여 곳이 넘게 늘었다. 독립서점 소개 사이트 '주식회사 동네서점'에 따르면 2015년 97개에 불과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884개로 8년 동안 아홉 배가량 증가했다.
독립서점은 단행본만을 판매하는 작은 서점을 일컫는 말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참고서와 학습 도서 등까지 판매하는 지역서점과는 결이 다르다. 독립서점 주인들은 외형적으로 숫자가 늘었지만 '현실은 겸업이 필수'라며 입을 모은다.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만 해도 '책방 오늘,'은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점 관계자는 2년 전 문학 웹진 '비유'에 "이익을 내지 못한다. 만성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 비이성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 자본의 논리와 상반되는 경영을 한 해 한 해 연장해 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실제 지역의 랜드마크가 아닌 이상 책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곳은 거의 없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쿠팡 등 온라인에서 책을 사면 보통 10% 할인에 5% 적립을 받지만 동네 서점에선 정가로 책을 판매한다. 독자 입장에선 배송 편의성이나 가격 측면에서 굳이 독립서점을 찾을 이유가 없다. 여기에 '유통 공룡'인 쿠팡이 점점 많은 출판사와 직거래를 트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독립서점의 입지를 좁힌다. 인터넷서점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60%가 넘는다. 올해 정부의 지역서점 지원 축소도 가뜩이나 열악한 생태계를 악화시켰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전통 중견 서점들도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대전 계룡문고가 올해 폐점했으며 춘천 광장서적도 지난 7월 부도로 영업이 중단됐다가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로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독립서점은 책을 기본으로 하되 체험을 유도하거나 다른 것을 붙이는 '끼워팔기' 전략을 구사한다. 책은 냄새가 나거나 유통기한이 정해진 상품이 아니다. 차와 커피, 술, 빵을 같이 팔기 쉽고 요즘에는 숙박까지 하는 '북스테이'도 인기다. 책방 한쪽에는 굿즈와 기념품을 팔고, 북콘서트와 글쓰기·독서 모임도 활발하다. '서점=책이 있는 공간'이란 개념도 확장되고 있다. 번역가가 자신의 작업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약사나 변호사가 운영하는 책방 등으로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남창우 주식회사 동네서점 대표는 "서점의 출발선부터 책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책이 너무 좋고,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향휘 선임기자]





![43만 찍었다..세븐틴 일본 돔투어 접수 "내년도 함께 하자"[종합]](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307052694758_1.jpg/dims/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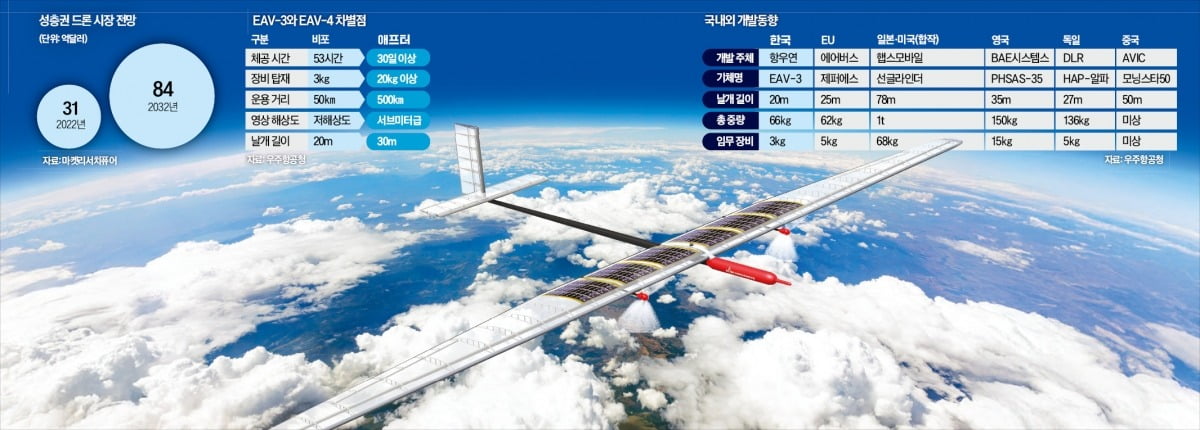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