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은 여전히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많지 않습니다. 한미약품의 새 표적항암제 ‘벨바라페닙’ 등 국산 신약이 하루빨리 개발돼야 합니다.”
신상준 연세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사진)는 4일 “환자가 많지 않은 데다 이전에 개발된 치료제가 적은 흑색종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흑색종 등 피부암과 대장암, 신장암 환자 등을 돌보는 신 교수는 항암제 개발 중개 연구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는 후기 암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피부암 중 가장 전이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악성 흑색종은 초기에 발견해 수술하면 5년 생존율이 99%에 이르지만, 원격 전이된 4기 이상 환자 생존율은 25%에 불과하다. 후기 암 환자를 위한 항암 신약 개발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의미다.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를 2015년 흑색종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약이 듣는 환자 20%가량은 장기 생존이 가능해졌다. 나머지 환자와 재발 환자 등에겐 여전히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드물다. 첫 치료제로 면역항암제를 쓴 뒤 2차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는 특정 변이(BRAF) 환자에게 쓰는 노바티스의 ‘라핀라’, 로슈의 ‘젤보라프’ 정도뿐이다. 신 교수는 “환자 유형을 고려하면 BRAF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17% 정도”라고 했다.
국내 환자의 10%가량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변이(NRAS) 환자에게 쓸 수 있는 허가받은 신약은 사실상 없다.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벨바라페닙이 해당 변이 표적항암제다. 의료 현장에서 허가 전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을 받아 활용을 늘리고 있는 배경이다. 목 안쪽 점막에 생긴 흑색종 탓에 호흡곤란 등으로 여명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은 한 환자는 벨바라페닙을 투여한 뒤 2년 넘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신 교수는 “국내 제약사들이 악성 흑색종처럼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희소·난치암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흑색종 치료제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치료를 위해선 국산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6 hours ago
2
6 hour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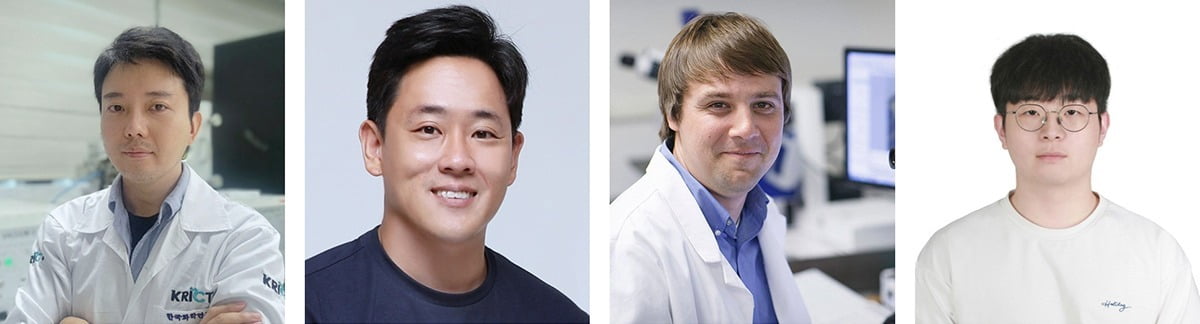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