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검사 앞두고 CEO 부른 금융감독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14822206.1.jpg)
금융감독원 임원들은 정기 검사 때마다 피검 금융회사 경영진을 불러 식사한다. ‘파트너스 미팅’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전 만남이다. 금감원 고위 임원이 검사가 임박한 시점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경영진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아예 관행처럼 굳어진 지 오래다.
최근 검사에 들어간 A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해당 금융사 경영진은 본점 건물에서 금감원 관계자들과 도시락 미팅을 했다. 검사를 앞두고 회사를 찾아온 금감원 직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행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사 방향에 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근래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며 “검사 결과 자체에 영향을 줄 순 없겠지만, 무겁지 않은 식사 분위기에서 검사 기조를 엿보는 자리가 됐다”고 했다.
또 다른 피검 금융사인 B사 등은 검사를 앞두고 금감원 관계자들과 식사하기 위해 CEO가 직접 여의도를 찾았다. B사 관계자는 “감독 기관에서 먼저 밥을 먹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임박해서 식사 날짜를 전달해와 스케줄을 전부 조정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사전 정보 교류를 위한 밥 한 끼 정도로 치부하기엔 뒷말이 무성하다. 식탁에 마주 앉은 이들의 갑을 관계가 너무 뚜렷해서다. 금감원의 괜한 ‘군기 잡기’ 논란만 이어질 뿐이다.
검사 전 식사 미팅 논란은 불필요한 의혹도 불러일으킨다. 왜 만났을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심지어 누가 밥값을 냈을지 온갖 추측만 난무한다.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감독당국과 기업 경영진 간 비공개 만남 자체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감독 기관 임원이 검사 직전에 금융회사 대표와 식사하는 것만으로 검사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검사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금융사를 감독한다. 금감원 임직원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불필요한 관행은 오해를 낳고 그간 쌓아온 조직 신뢰를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 금융사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사 임직원에게 자주 하던 말이다. 금감원 직원들도 이를 되새겨야 할 듯싶다.

 5 hours ago
2
5 hours ago
2
![[백광엽 칼럼] '지대 추구 제도화'로 치닫는 상법 논란](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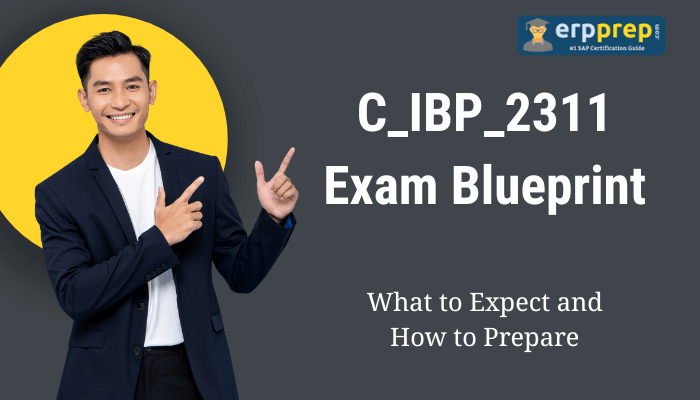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