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TSMC CEO의 농담이 뼈아픈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2217296.1.jpg)
2014년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몇몇 고객사 주문을 삼성에 뺏겼다. 최첨단 공정에서 삼성 점유율이 TSMC를 넘어설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쟁자 부상에 바짝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TSMC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웨이저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 열린 ‘제12차 대만 국가과학기술회의’에서 여유로운 농담을 건냈다. “칩이 부족하니 고객들이 TSMC에 너무 예의 바르게 대해줍니다.“
TSMC는 40년 가까이 위험하고 고된 파운드리 관련 업무를 묵묵히 해냈다. 밤새워 일하고 연구개발(R&D)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부단한 노력은 고객의 인정으로 돌아왔다. 수준 이하의 설계도를 건네도 척척 칩을 뽑아내는 솜씨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칩 제작을 부탁했다. 우리의 상황은 정반대다. 지난주 한국 최고의 테크 리더들이 모인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는 ‘K반도체’에 치열함이 사라졌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주 52시간 제도를 핑계로 느슨하게 일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다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게 반도체특위의 지적이었다.
정부 정책도 비교된다. 대만 정부는 ‘2+4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해 매년 유학생 2만5000명을 지원하고 AI 인재 10만 명 이상을 육성하고 있다. 이들이 TSMC의 숨은 경쟁력이다. 반도체 기술을 앞세워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대 국가가 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지만 대만보다 행동이 굼뜨다. 인공지능(AI)산업의 ‘쌀’로 불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이슈만 해도 그렇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4대 과학기술원에 GPU가 하나도 없다”며 2030년까지 GPU 3만 개를 확보하는 계획을 2년 내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의 인식은 다행이지만 GPU 3만 개로 AI 3대 강국은 어림도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GPU는 48만5000개로 추정된다. 일론 머스크 CEO는 GPU를 100만 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메모리 강자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통해 심기일전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결정권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쥐고 있다. 엔비디아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판로 개척 자체가 불가능하다.
K반도체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권은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과 엔지니어는 R&D에 매진해야 한다. 대만에 끌려다니는 굴욕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뛰는 것이다

 20 hours ago
3
20 hours ago
3
![[GEF 스타트업 이야기] 〈54〉한 없이 절망 했고, 한 없이 기뻤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27/news-p.v1.20241227.334791c78da4446fa516fc273b27cda5_P1.jpg)
![[기고]'전력량' 앱으로 실시간 관리만해도 겨울철 전기요금 낮춘다](https://thumb.mt.co.kr/21/2024/12/2024122616403434361_1.jpg)
![[기고]가축분뇨, 거름을 넘어 에너지로 재탄생](https://thumb.mt.co.kr/21/2024/12/2024122600145078921_1.jpg)
![[우보세] AI가 만드는 '균형 잡힌 부조화'](http://thumb.mt.co.kr/21/2024/12/2024122611243228392_1.jpg)
![[기자수첩]빈 수레가 요란하다](http://thumb.mt.co.kr/21/2024/12/2024122013375327470_1.jpg)
![[투데이 窓]스타트업과 국가와 정치](http://thumb.mt.co.kr/21/2024/12/2024122517281345412_1.jpg)
![[MT시평]계엄의 역사](http://thumb.mt.co.kr/21/2024/12/2024122518524043363_1.jpg)
![[사설]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2/26/13073438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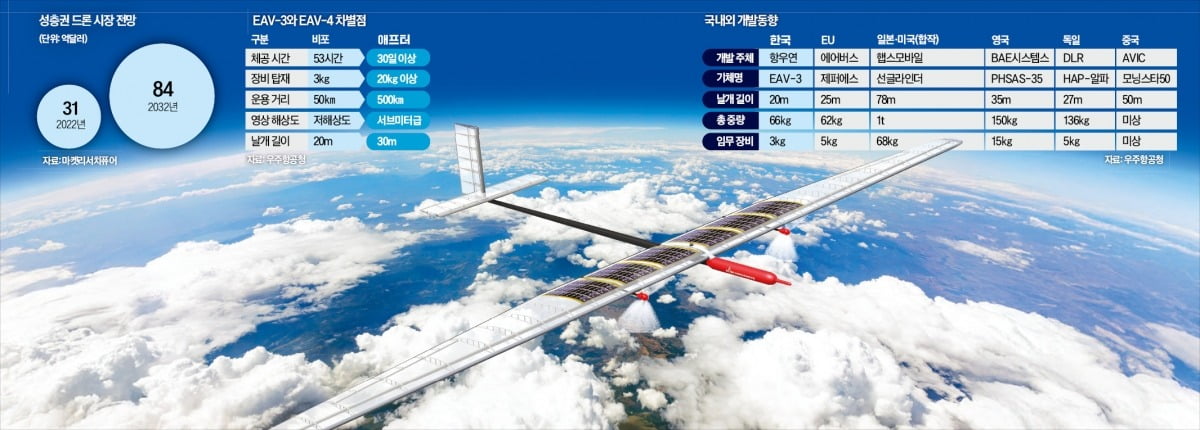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근처 갈 만한 커피숍 알려줘"…'이 번호' 누르자 챗GPT가 받았다 [송영찬의 실밸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3952.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