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의 시선] 환란 속의 기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23536927.1.jpg)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가지고 있는지도 잊고 있었다. 1999년 1월 초판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은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XXX 비판’ 식의 제목을 지닌 책들의 원조(元祖)다. 저자 이케하라 마모루는 1972년부터 한국에 주로 거주하며 한·일 간 경제 관련 로비스트로 일한다. 지한파(知韓派)이자 친한파(親韓派)인 그는 ‘내부 속 외부’의 시선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얘기한다. 비판 속 깊은 애정이 전해지는 이 책은 반일 정서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게 심한 때였음에도 2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호기심을 넘어 한국인들이 자기반성에 옹졸하지 않다는 증명이었다.
<한국 한국인 비판>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 과거의 여러 모습들이 있다. “경제는 1만달러, 의식은 1백달러”라며 자조하던 시절이었다.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이라는 용어가 지구촌을 떠돌았다. 386세대 막내 격인 내 또래 이상 나이가 든 한국인이라면 잡아떼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의 비매너에 인상을 찌푸릴 적에 우리는 과거 우리의 국제적 수준을 목도한다. 그러나 25년 정도가 흐른 지금 한국인의 그러한 단점들은 많이 고쳐졌다. 더욱이 문화 경쟁력은 물론 경제력에서도 일본을 수치상으로 정확히 앞서게 되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그러면 그랬지 한국이 일본에 굳이 후벼 파는 반일 감정 같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다.
하물며 예나 현재나 한국을 식민지쯤으로 여기는 언행을 일삼는 건 중국이지 일본이 아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를 침략하면 박살 내고 아니면 서로 똑같이 대하고 지내면 된다. 한국과 한국인을 어둡게 평가했던 기록들은 1948년 이래로 차고 넘치지만 대한민국은 그 예견들을 짓밟고 일어나 당당히 빛나고 있다.
해후(邂逅)하게 된 <한국 한국인 비판>을 뒤적이며 이런 질문에 휩싸인다. 문화, 경제는 큰 발전을 이룬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는 날이 갈수록 저질과 끝장으로 치닫는 건 왜일까? 과거를 현재보다 아름답게 포장하기 마련인 뇌(腦)의 농간 때문일까? 아니다. 나는 한국 정치가 최악의 기로에 섰다고 본다. ‘내부의 외부’들이 지적해왔던 우리의 위험성이 정치 쪽에 ‘몰빵’돼 극에 달했고 이는 돌이켜보면 망할 고비가 수십 번도 더 있었던 대한민국을 용케 지켜주던 운이 이젠 고갈된 게 아닌가 싶은 공포로 육박해온다.
나는 ‘386 운동권적인’ 386세대가 바로 그 한국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무지하고 탐욕스럽고 위선적이고 배은망덕하며 자가당착 인지부조화적인 ‘정치적 나르시시즘 386탈레반’이 그 주범이라고 믿는다. 현실은 2025년인데, 우리의 사회적 국가적 실존은 1980년대에 특화 강요돼 있다. 개혁은 공멸하는 파국을 피하려 생겨나는 지혜와 발전이다. 내가 지금 ‘정치적 만악의 근원’이 386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토록 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386은 대한민국을 조선처럼 말아먹는 그날까지 치유도 개선도 되지 않을 고질병과 돌림병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나는 386이 저지르는 ‘세대 계급적 약탈’과 가스라이팅이 한국 사회에서 카스트제도처럼 굳어져서 낙담했더랬다. 나는 2030 청년들이 늙어 죽도록 386의 노예로 살아갈 게 뻔해서 슬펐고 괴로웠더랬다. 그런 내게 지난겨울 어느 날부터의 100여 일은 충격이었다. 386이 목에 채워놓은 쇠사슬을 2030 청년들이 스스로 끊어내고 자신들의 운명을 혁명했다. ‘환란 속의 기적(miracle)’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바로 여기에 지난겨울부터 이 봄까지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본다. 누구를 지지하고 증오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악마 독재 면허증을 인정 않는 이 청년들은 ‘결정적 자기모순’에 빠진 거짓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공화주의’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1935년생 이케하라 마모루는 현재 생존 여부가 검색이 안 된다.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역사에서 기적은 드물고, 찾아와도 여전히 힘겨울 수는 있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 저 청년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맞다. 그들은 환란 속에 있었으나 혼돈은 거부했다. 역사는 이런 것을 ‘희망’이라고 부른다.

 19 hours ago
2
19 hours ago
2
![[부음]김동건(HLB US법인장)씨 빙부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광화문] 함께 가야 멀리 간다](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314103293574_1.jpg)

![[기자수첩]승복의 시간](https://thumb.mt.co.kr/21/2025/04/2025040308320541909_1.jpg)
![[공관에서 온 편지]카나리아 섬의 韓 선원들을 기리며](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MT시평]산불 재해와 농산물 비축 필요성](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215251278147_1.jpg)
![[투데이 窓]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았던 젠슨 황](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306092372169_1.jpg)
![[사설]한미 FTA ‘파기’에 해외기지도 쑥대밭… 상상 가능한 ‘최악’](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3/13134670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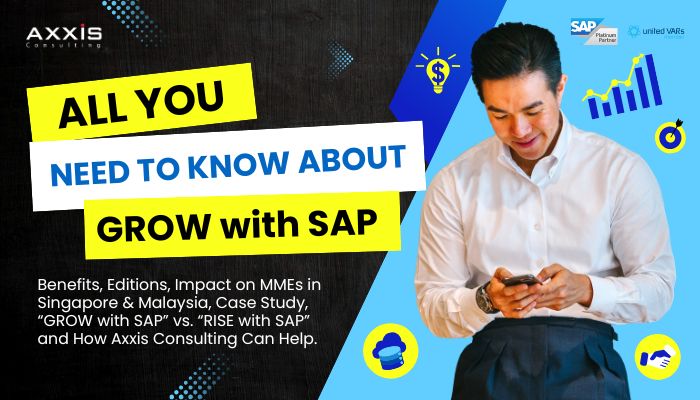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