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중소형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이 진입해온 유럽의 미들마켓(middle market·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시장)에 대형 PE들이 가세하면서 시장 구도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대형 운용사들이 미들마켓 영역으로 발을 넓혔으나, 보수적인 운용 철학과 로컬 중심의 투자 전략을 고수해오던 유럽은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 사진=픽사베이 갈무리 |
27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유럽 사모펀드운용사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39개의 미들마켓 전용 펀드를 조성하면서 418억유로(약 66조 3880억원)를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규모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펀드 규모는 커졌으나 펀드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유럽 미들마켓에는 112개 펀드에 총 642억 유로가 조달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9개 펀드에 418억 유로가 쏠렸다. 대형 펀드로 자금이 대거 쏠리면서 소규모 펀드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 결과다.
특히 올해 조달된 자금의 절반 가량은 5개의 대형 펀드에 집중됐다. 룩셈부르크 기반의 CVC캐피털파트너스는 지난 3월 46억유로(약 7조 3028억원) 규모의 미들마켓 펀드를 결성하면서 유럽 미들마켓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펀드를 탄생시켰고, 영국의 오클리캐피털 역시 같은 달 45억유로(약 7조 1425억원) 규모의 미들마켓 펀드를 결성하면서 그 뒤를 바짝 좇았다. 또 4월에는 영국의 인베스트인더스트리얼과 IK파트너스는 각각 40억유로와 33억유로 규모의 펀드를, 1월에는 프랑스 기반의 아르디앙이 32억유로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면서 이들 다섯개 펀드에 총 196억유로(약 31조원)가 쏠렸다.
조 단위 바이아웃 거래를 체결하던 대형 운용사들이 미들마켓에 진입하는 배경에는 거시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처를 찾으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고금리로 빅딜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낮고 딜 경쟁이 덜한 미들마켓은 리스크 대비 수익 매력이 크다는 계산이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경영 개선을 통한 밸류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운용사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도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에선 블랙스톤과 KKR 등 대형 운용사들이 미들마켓 전용 펀드를 결성하면서 시장 경계를 허물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 역시 미들마켓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시장이라는 이유에서 관련 펀드에 대한 출자를 늘리기도 했다.
미국과 달리 로컬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해온 유럽에서 수십억 유로의 미들마켓 펀드가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유럽의 중소중견 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 사모펀드운용사들로부터 투자 받는 기업은 연간 1.5%에 불과했다. 그만큼 유럽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크다는 의미로, 대형 사모펀드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현지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글로벌 LP들이 규모와 실적이 검증된 운용사에 자금을 몰아주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이 다양해지면서 미들마켓의 정의 자체가 재조정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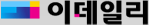 4 days ago
8
4 days ago
8


![[마켓인]석화·이차전지·건설, 신용도 흔들…하반기에도 경고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0101264.jpg)
![[마켓인]준오헤어 "경영권 매각 사실무근"…해외 진출 위한 투자자 물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0101412.jpg)

![[마켓인]"이번엔 될까" MG손보, '정상 매각' 재시동...인수자 찾기 '산 넘어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0101112.jpg)
![[마켓인]넥센타이어 회사채 수요예측에 주문 7배 가까이 몰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0101263.jpg)


![천하람 “국민의힘, 죽어버린 나무…물 줄 필요 있나”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02/131732216.1.jpg)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