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TechCrunch, Hacker News, Fortune Term Sheet 정도만 보면 스타트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술의 보편화와 언론의 회의적 시선으로 전통 미디어와 스타트업 간의 내러티브 충돌이 생김
-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창업자와 빌더들이 직접 서사를 만들고 전파하는 블로그와 뉴스레터 중심의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함
- COVID 이후 특히 Not Boring, Lenny’s Newsletter, The Generalist, Pragmatic Engineer 등 수많은 창업자/VC/엔지니어 기반의 미디어가 등장함
- 이러한 현상은 17~18세기 지식인의 서신 네트워크인 ‘Republic of Letters(문필공화국)’와 유사하며, 오늘날에는 이를 블로그, 팟캐스트, 트위터, 유튜브 등으로 구현하고 있음
- 우리는 지금 "자격이 아닌 통찰로 평가받는 시대" , 즉 기술 중심의 ‘문필 공화국’ 의 새로운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음
Startup Storytelling
-
기존 미디어 환경의 중심
-
테크가 주류가 되기 시작한 변화
-
주류 언론의 회의적 시선
- 언론은 본래 회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점차 기술기업에 대한 불신이 표준이 됨
-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은 2010년대 기술산업까지 확산되었고, 신문 신뢰도는 16% 수준에 머무름
-
Axios, The Information 같은 신생 매체들도 빅테크 이슈와 정치에 초점을 맞추거나, '스타트업 비판'이라는 언론 윤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하게 됨
-
기술 서사의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
- 결과적으로 테크업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쓰기 위해 블로그 생태계를 중심으로 풀뿌리 서사 운동을 시작함
- 이는 점차 ‘탈중앙화된 내러티브 생산 기계’로 발전,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이야기’가 주도권을 되찾음
Birth of The Blogosphere
-
블로고스피어의 시작과 기술 미디어의 기원
- 블로고스피어는 1999년 또는 2002년경에 탄생했으며, 기술 산업을 해석하는 주요 매체로 발전함
- 초기 기술계의 '고대 문서'는 각기 흩어진 개인 블로그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필진으로는 Paul Graham, Fred Wilson, Mark Suster, Bill Gurley, Pmarca, Brad Feld, Hunter Walk, Sam Altman, Tom Tunguz 등이 있음
- 이들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블로깅을 시작했고, 특히 Bill Gurley는 1996년부터 시작한 선구자였음
-
투자계 전통의 글쓰기 문화와 그 영향
-
Howard Marks와 Warren Buffett은 수십 년간 투자 세계에서 글쓰기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온 대표적 인물
- 특히 Buffett는 1959년부터 투자 파트너십 시절부터 글을 써왔으며, 지금까지도 연례 서한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 중
- 기술계 인사들도 Buffett의 글쓰기 방식에서 명료한 사고와 내러티브의 소유권이라는 면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자산 축적 방식은 다름
-
개인 블로그에서 전문 분석으로
-
대중성과 전문성 사이의 균형
-
초창기 스타트업 미디어의 모습
- 첫 10년간 스타트업 미디어는 위대한 개인 블로거들의 글과 소수 전문 미디어, 그리고 TechCrunch, The Information 같은 기술 저널리즘 매체들의 혼합체였음
- 일부 대형 언론도 때때로 스타트업 보도에 참여했지만 깊이나 지속성은 부족했음
- 그러던 중, 변화가 시작됨
"Business Is The New Sports"
-
팬데믹이 촉발한 스타트업 미디어의 대폭발
-
스타트업 미디어 창작자들의 약진
- 팬데믹 전후로 뉴스레터 기반 미디어들이 급성장함
-
팟캐스트 네트워크의 축적과 폭발
-
새로운 ‘밈 생산 수단’의 정착
-
"The Meme Economy"라는 표현처럼, 스타트업 내러티브를 만드는 생산 장치들이 자리를 잡으며 창작의 문턱이 낮아짐
- 기술·자본·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업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짐
-
전례 없는 기업 스토리텔링의 확산
- 기존 기자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쓴 이야기들이 중심이 됨
- 팬데믹 이후의 시대정신 — 낙관주의, 유머, 미국적 역동성 — 과 맞물려 스타트업과 창업가 스토리텔링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짐
The Newfound Republic of Letters
-
21세기형 ‘지적 커뮤니티’로서의 스타트업 미디어
-
새로운 Republic of Letters의 특징 네 가지
-
지식보다 명함이 중요했던 기존 구조 붕괴 → 인사이트로 지위를 얻는 시대
-
중앙집중형 권력의 해체 → 직책보다 ‘사고하는 사람’ 중심의 영향력
-
기성 제도에 대한 불신 → 새로운 제도(대학, 언론, 연구기관) 설립 움직임
-
지식 생산에 대한 집단적 헌신 → 블로그, 팟캐스트, 오픈소스 코드의 폭발
-
테크 분야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례
-
다양한 형태의 참여와 콘텐츠 생산
- 블로그: Mostly Metrics, Digital Native
- 팟캐스트: Age of Miracles, AI & I
- 유튜브: Cleo Abram, MKBHD
- 플랫폼: TBPN, Sourcery, Newcomer, The Free Press
- 기관: IFP, Arc Institute, Long Now, Astera Institute
- 출판사: Stripe Press, Scribe Media
- 인쇄 매체: Arena, Asimov Press, Works in Progress, Palladium, The New Atlantis, Colossus Review
- 영상 제작사: Story Co., Coinbase 다큐
-
정보 과잉과 새로운 과제
- 뉴스레터가 100만 구독자를 넘고, 팟캐스트가 체이스 센터에서 생중계 되는 시대
-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signal과 noise를 구분하는 능력, 잠재적 목소리를 발견하는 구조가 새로운 과제가 됨
I Need To Speak
-
팟캐스트의 급증: 말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
- 테크 분야의 팟캐스트는 Invest Like The Best, 20VC, Stratechery 정도가 중심이었으나
- 오늘날은 Pirate Wires, Sourcery, No Priors, MAD Podcast, How I Write 등으로 다변화됨
- 블로그 기반 미디어도 팟캐스트로 확장: Lenny’s Podcast, Not Boring Radio, The Generalist Podcast
- VC나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다수 팟캐스트 개설: BG2 Pod, Uncapped, Generative Now, Tech Today 등
-
Colossus, Turpentine 같은 팟캐스트 네트워크도 형성되며 산업화 흐름 뚜렷함
-
벤처캐피털의 미디어화 실험
-
팟캐스트는 줄고 있지만, 테크 분야는 예외
- 전반적으로는 COVID 이후 신규 팟캐스트 수 감소 중이나, 테크 씬은 오히려 더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함
- 콘텐츠는 과잉되어도, 말할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블로그도 폭발 중: Substack 기반의 서사 확장
-
콘텐츠의 양적 팽창이 가져오는 흐름
- 정보의 폭발은 종종 압도감을 주지만, 동시에 아이디어의 경쟁을 가속화
- 조직들은 점점 더 ‘go direct’를 지향 → 중간자 없이 직접 이야기하는 기술 연습의 장
- 기술, 낙관주의, 진보 등 믿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은 동기가 미디어 확장의 원동력
-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hyperlegibility(초명확성) , 즉 나의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으로 콘텐츠 생산을 이해함
Pursuing Hyperlegibility
-
Hyperlegibility: 나를 위한 독자를 명확히 타겟팅
- Packy McCormick는 Hyperlegibility란, 명확함을 넘어서 '오해의 여지 없는' 수준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
- 단순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메시지를 알아볼 사람에게 정확히 꽂히는 메시지가 중요함
- 대중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는 종종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가 되기 쉬움
-
Palmer Luckey의 말처럼, “나의 'ride or die' 1%만 알면 된다” 는 관점이 핵심
- 진정한 하이퍼레지빌리티는 무작위 대중 대상이 아닌 타겟 집단에게 정확히 도달하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임
-
For The Vibes: 인터넷은 '진동'의 확장 장치
- 블로그, 팟캐스트,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우주에 나의 바이브(vibe)를 날리는 행위이며, 그로 인한 우연한 인연과 기회가 본질
- 과거 Blogger나 RSS 기반의 블로그 구독 시대에도 이 감성은 존재했음
- COVID 이후,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키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조차 온라인이 지배하게 됨
- 현실보다 더 많은 친구와 동료가 온라인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이 현상이 진짜 메타버스의 모습임
-
“메타버스는 VR 헤드셋이 아니라 바이브오스피어(Vibe-o-sphere)” 라는 통찰은, 성공하려면 이 감도적 영역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함을 말함
Building In The Vibe-o-Sphere
-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 인터넷상 콘텐츠의 양은 이미 폭발했기에 “굳이 내가 더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회의감이 많음
- 하지만 Dwarkesh Patel의 말처럼, “창작의 플라이휠은 청중 성장보다 창작자 자기 자신을 위한 성장에 있음”
- 콘텐츠 제작은 외부의 반응보다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가치 있음
- 누가 듣지 않더라도 글을 쓰고, 말하고, 만들라는 조언은 결국 스스로의 진화를 위한 것임
-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밀고 나가라
-
어디서 시작할까? ‘공개’가 아니어도 괜찮다
- 꼭 Substack이나 X에 공개적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님
-
친구들과의 그룹채팅도 훌륭한 시작점, 사적 공간에서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음
-
Katherine Boyle: “그룹챗은 서로의 생각을 깊이 있게 다듬는 21세기의 토론장”
- 때론 내가 보고 싶은 생각을 모아주는 한 사람이 전체 대화의 75%를 책임질 수 있음 — 그 사람이 되라
-
창작자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
a16z는 “VC로 수익화하는 미디어 회사”라는 말처럼, 창작 그 자체보다 연결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
-
TBPN 같은 곳은 광고와 스폰서를 적극 수용해 지속 가능성 확보
- 반면 Quartz는 수익화 실패로 사라진 사례
-
내가 추구하는 미디어의 North Star는 무엇인지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함 (인지도, 커뮤니티, 채용, 리크루팅, 투자 등)
This Is Personal
-
스타트업에 빠져든 계기: 이야기의 힘
- 이 글은 단순한 메모였지만, 쓰는 동안 나의 시작(Root)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자각하게 됨
- 계기는 StartUp 팟캐스트였고, 창업자가 팟캐스트 회사를 창업하며 그 과정을 팟캐스트로 다룬다는 메타 설정에 강하게 끌림
- 투자자 Chris Sacca에게 피치하는 장면, 공동창업자와 협상하는 어려움 등, 진짜 사람들의 서사에 공감하며 빠져들었음
-
스타트업은 곧 스토리텔링
-
Acquired 팟캐스트를 2015년부터 듣기 시작했고, 글도 계속 써옴
-
Contrary에 합류한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도 Contrary Research라는 미디어/리서치 플랫폼 구축
- 결국 창업 미디어의 진화사를 따라가며 느끼는 바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자신의 여정 그 자체였음
-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
-
New Republic of Letters의 시대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낌
-
“이야기로 연결되는 세상”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모든 것
- 그리고 동시에, 할 이야기는 아직 많고, 써야 할 이야기들은 이제 시작임
Appendix
Reinventing Knowledge 요약
-
핵심 개념: 새로운 지식 제도의 순환
- 『Reinventing Knowledge』는 서구 문명이 진보하는 원동력으로 기존 지식을 보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회로 전달하는 제도의 발명을 제시함
- 지난 2,500년 동안 문명은 위기 → 제도 혁신을 반복하며 6가지 지식 제도를 창조해 왔음: 도서관, 수도원, 대학, 연구소, 학회, 인터넷 등
-
반복되는 5가지 패턴
-
위기 → 재창조: 시대의 충격과 기술(파피루스, 인쇄술, 웹 등)이 새로운 지식 전달 구조로 재편됨
-
제도 > 개인: 위대한 아이디어보다, 지속 가능한 제도 안에서 자리잡는 평범한 아이디어가 더 오래감
-
비용 있는 헌신 구조: 수도원 서약, 교수 테뉴어 등은 잡음을 걸러내고 신뢰를 주는 구조로 작동함
-
정보 ≠ 지식: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큐레이션, 토론, 검증,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지식이 완성됨
-
현대의 위기: 인터넷은 유토피아적 지식 유통망처럼 보이지만, 검증 없는 콘텐츠 범람으로 지식 기반의 신뢰가 흔들림
-
스타트업 미디어와의 연결고리
-
학계나 저널리즘보다 Republic of Letters에 더 가까운 구조
-
Substack, Discord, 개발자 블로그 등은 중앙집중적 캠퍼스보다 네트워크 기반 영향력
-
글과 대화로 명성을 얻고, 신뢰를 구축
- 신뢰를 잃은 기존 제도 대신, 기술 커뮤니티가 자체 검증/토론 구조를 만들며 지식을 전파
- 중요한 건 기존 요약이나 큐레이션보다 신규 지식의 생산 (playbook, 코드, 데모 등)
-
“New Republic of Letters”을 설명하는 10가지 인용구
-
"Republic of Letters는 원래 우편으로 교류하던 손글씨 편지를 시작으로, 이후 인쇄된 책과 저널로 이어진 국제적인 학습 공동체로 정의될 수 있다."
-
"이 제도는 전례 없는 수준의 격변적 변화(disruptive change) 에 완벽히 적응된 구조였으며,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기반으로 그 정당성을 확립했다."
-
"Republic of Letters는 다른 어떤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그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공식적인 자격증, 학위,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시민적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
-
"이 공화국은 국경을 초월했을 뿐 아니라 세대까지도 넘나들었다. 이는 학자들을 시간을 초월해 연결하는 협력 프로젝트로 명시적으로 간주되었다."
-
"Republic of Letters의 소통은 실제 대면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참여자들은 서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흔했다. "
-
"편지 쓰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미덕들을 강조했다. 예의, 우정, 관용, 너그러움, 그리고 특히 관대함(tolerance) 등이 그것이었다."
-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편집하고 출판함으로써 유럽 최초의 ‘유명 지식인(celebrity intellectual)’ 이 되었다."
-
"우리가 보았듯, 편지, 책, 박물관은 대학의 여러 실천들을 변화시켰고, Republic of Letters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산 제도(umbrella institution)로 작용했다. "
-
"초기 인터넷 개척자들의 '사이버문화(cyberculture)'는 종교에 정치적으로 물든 중세 대학으로부터 벗어난 근대 초 Republic of Letters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
"이른바 '정보 시대(information age)'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종종 지식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
이 인용구들은 분산된 자발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기존의 위계적 구조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이는 오늘날 스타트업 미디어 생태계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역동성이다.

 8 hours ago
3
8 hours ag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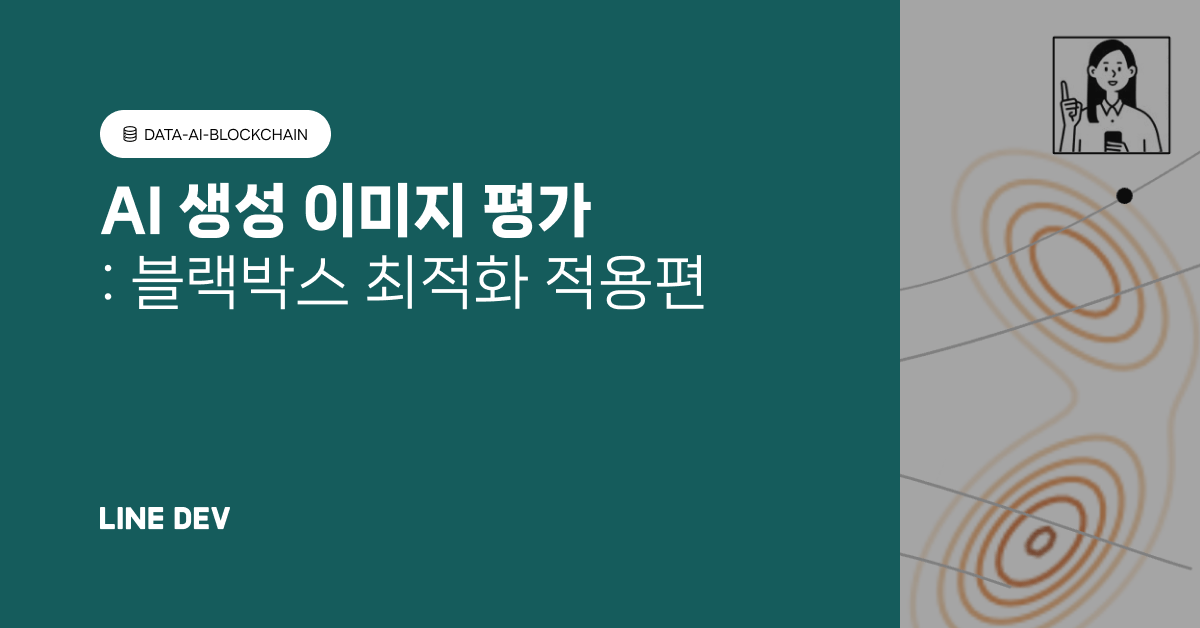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