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11시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한 과수원에서 만난 박모 씨(67)는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숯덩이가 돼버린 사과나무를 만지며 말했다. 산 중턱 비탈면을 따라 조성된 3300㎡(1000평) 규모의 사과밭은 온통 시꺼멓게 변했다.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흙이 흘러내렸다.
지난달 역대 최악의 산불을 맞아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에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여름 두 차례 쏟아진 폭우로 청송과 인접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영양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주민 등 2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당시 산지 나무를 잘라 만든 논밭과 주택이 집중 피해를 입었다. 박 씨는 “산불 나 나무가 타버린 상황에서 장마 오면 대규모 산사태가 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복구가 안 될 텐데 빨리 대책을 내야 한다”고 했다.
●“산불 발생 후 산사태 위험 200배 이상 높아져”지난달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등 영남 지역에서만 4만ha(헥타르)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나무와 풀은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소나무가 많은 경북 지역은 더욱 비상이다. 소나무는 바위나 돌덩이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돌을 붙잡고 있는데, 이번 산불로 소나무 군락지 대부분이 불에 타 소실됐기 때문이다. 큰비가 내리면 흙은 물론 돌더미가 굴러 내려와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서 산사태 위험도가 1, 2등급으로 높은 곳이 전체 분석 면적의 20%를 넘었다. 산림청은 나무 면적, 경사도 등을 따져 산사태 위험을 1~5등급으로 나누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이 큰 곳이다.
이번 산불로 많은 나무가 불에 타면서 산사태 위험도는 한층 높아졌다.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박사는 “산불 피해 지역의 지형과 강수량 등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산불이 난 산의 경우 평소에도 보통 산보다 산사태 위험이 최소 10배에서 최대 200배 이상 높아진다”라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긴급복구할 지역부터 파악해야경북도는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해 8일까지 일차적인 산림 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전문가 191명을 현장에 투입해 위성영상과 드론 등을 활용하고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한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산불 폐기물 처리에만 2, 3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최소 1500억 원이 들 전망이라 산사태 대비는 요원한 상태다.
2022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 지역도 아직 복구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매년 산사태 위협을 받고 있다. 당시 산림 2만여㏊가 훼손됐는데 벌채율은 34%(2360ha), 조림률은 25%(1758ha)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에는 군은 주민들에게 선제적 대피명령을 내셨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 전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긴급 복구지역을 추려 여름 장마철이 오기전 작업을 마쳐야한다고 제언한다. 이병두 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산사태 위험지도와 산사태 시 붕괴된 흙과 모래, 바위 등이 흘러내리는 속도 등을 분석한 토석류 예측지도, 이번 산불 피해구역 지도, 주변 민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긴급 복구 지역 먼저 파악해야한다”며“해당 지역에 산불 피해목 등을 이용해 산사태 방어막과 사방댐 등을 긴급히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 하동 산불로 주민 326명 대피
이날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도 7일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점과 약 3㎞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림당국은 예초기 작업 중 불이 붙어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동군은 산불 확산에 따라 6개 마을 주민 326명에게 옥천관 및 옥종고등학교 등으로 대피시켰다.청송=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4 hours ago
2
4 hour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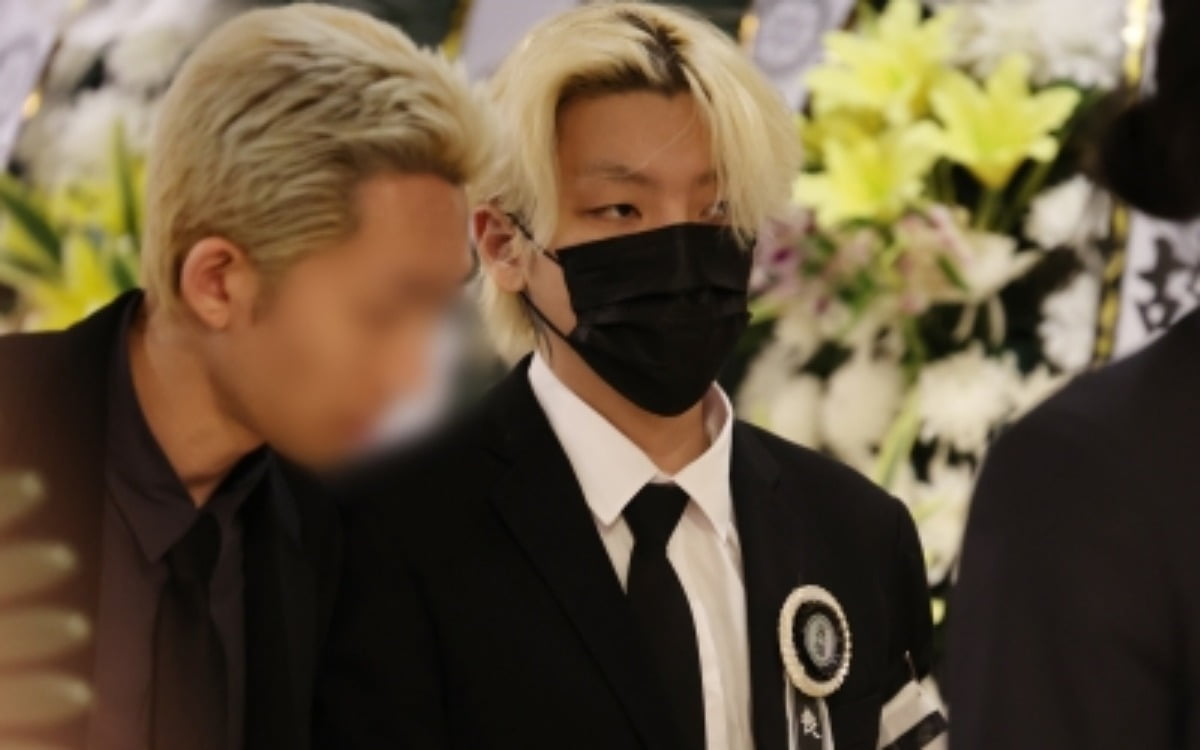


![[신문과 놀자!/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경제]같은 물건인데 나라별 가격 큰 차이… 요동치는 환율 탓](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7/131367265.1.jpg)
![[신문과 놀자!/풀어쓰는 한자성어]首鼠兩端(수서양단)(머리 수, 쥐 서, 두 양·량, 끝 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7/131367249.1.jpg)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수학적 통계 활용해 의료 혁신 이끈 나이팅게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7/131365337.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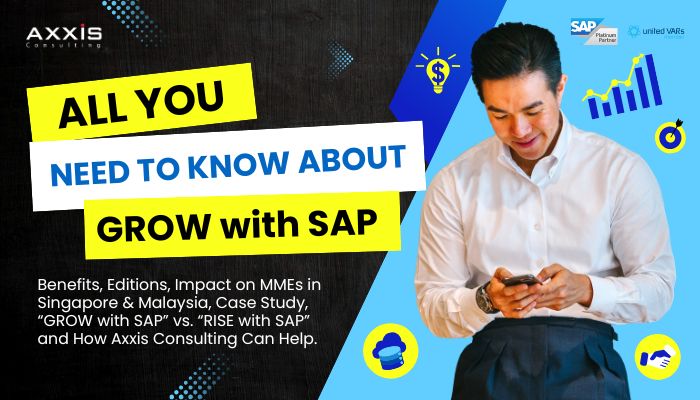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