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다. 기록이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은. 일본 테시마 미술관에 다녀왔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랬는데 그래, 그리 생각할 수 있겠다. 이곳엔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통상 지녀야 하는 당연한 것들이 없다. 네모반듯한 화이트 큐브라던가 작품을 비추는 조명이라던가 줄지어 걸린 작품들. 그런 게 없다. 그런데 놀랍다. 미술관 자체로 완전하다고 느낀다. 충분하다고 여긴다. 분명 인위일 텐데 온전히 자연이라 느낀다.
테시마 미술관은 자연의 범주 안에 존재한다. 버려진 섬을 '예술 섬'으로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하나로, 테시마 섬 꼭대기에 있다. 배 타고 버스 타고, 미술관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바닷길이다. 미술관에 도착하면 겨우 한 사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바닷바람에 귀를 씻으며 오솔길을 지나면 땅에 납작 엎드린 미술관이 나타난다. 신발을 벗고 사진 금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공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리 경건한가.

'압도됐다.'라고 말하긴 싫다. '감동이다.'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드넓은 공간에 하늘과 바람과 물과 나. 세상의 본질만 남아 마주한 것 같다. 여기서 더 무엇이 필요한가 깨우치게 된다. 고요히 모든 걸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예술이 주는 가장 맑고 좋은 것을 온몸으로 받는다. 이곳은 악인이 올 수 없을 것만 같다. 영 맑은 이들만 함께 하는 것 같다.
하늘로 열린 거대한 둥근 문, 숲으로 뚫린 맑고 푸른 문, 그곳에서 춤추는 바람, 발을 만지는 다정한 햇살 그리고 바닥의 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방울들. 혼자였다가 함께 뭉치고 그러다 다시 작은 물길이 되기도 하고. 끝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이라는 물방울들에 그만 털썩, 살아있는 예술 앞에 주저앉았다. 물론 이 모든 영성에의 경험은 철저히 설계됐을 것이다. 자, 이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들아 무릎 꿇어라, 경외감이 컨셉일 것이다.
알면서도 조아려진다. 생의 순리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진다. 삶의 본질에 대해.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홀로 있었다. 공간에 든 모두가 오롯이 혼자가 됐다. 그렇게 작은 물방울이 되어 영원 같은 순간을 경험했다. 테시마 미술관은 낙후한 지역을 살리고자 정부, 기업, 민간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어지고 관리되는 미술관이다. 일본의 미술관을 돌며 이젠 질투도 나지 않는다. 다만 배울 점과 우리 미술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일본은 지역과 경제를 살리는데 문화 예술을 제대로 활용했다. 잘 지은 미술관 하나가 지역을 살려내고 예술의 중심이 됐다.


우리에게도 멋진 로컬이 있다. 특별한 예술가들도 있다. 다정한 향유자들도 있다. 이를 이어줄 좋은 기획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단순하고 평평한 기획으론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 수 없다. 오감을 열어주는 몰입의 경험, 향유를 넘어서는 예술적 체험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테시마 미술관에서 우리는 감각이 무한대로 확장됨을 느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테다. 우리나라에도 영성이 깃든 구도하는 미술관, 지역을 살리는 미술관이 나올 것이다. 이미 다양한 미술관들이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과 진심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 미술관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소이기 때문이다. 깊고 맑은 품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지영 예술 칼럼니스트·(주)즐거운예감 대표

 1 month ago
3
1 month ago
3

![[포토] 설 명절 쌀·잡곡 선물 세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601.jpg)
![[포토] 농협유통 쌀·잡곡 선물 세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600.jp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근처 갈 만한 커피숍 알려줘"…'이 번호' 누르자 챗GPT가 받았다 [송영찬의 실밸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395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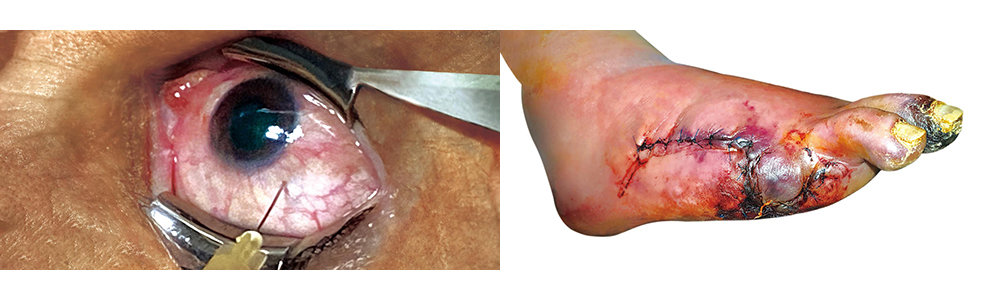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