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산불은 청년이 떠난 마을을 평생 지키던 어르신들이 생전 처음 경험한 ‘괴물 산불’이었다. 실감이 나질 않으니 공무원들의 대피 권유에 꿈쩍하지 않기도 했다. 도지사가 경찰에 “제복 입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요청할 정도였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먼저, 노인만 남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관군 대응에서 사실상 ‘민’은 사라졌다. 산불 진화 작업 자체를 감당하기에는 ‘관’의 인력이 부족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군의 지원도 소극적이다. 그래서 민의 역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가칭 ‘지역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퇴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대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 인력으로 재난대응 예비군을 만들자. 전문 소방대원을 투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피를 지원하는 체계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하면서 교육과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 특성에 맞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대상자 특성 맞춤형 대피 시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체육관 텐트 생활은 노인, 특히 장애인에게는 너무 힘들다. 거동 불편자들의 특성에 맞는 숙박 시설을 유사시 대피 장소로 지정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구호 물자가 물류창고에 쌓이기만 할 수 있다. 대피 초기에는 물자 부족이 문제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물자들이 넘쳐나게 된다. 그런데 이 중 내게 당장 필요한 파스가 없다면 넘쳐나는 지원 물자도 무용지물이다. 상부하달식 물자 지원 체계의 한계다. 택배 물건을 주문하듯 각 대피소 현장에서 필요 물품 목록을 입력하고 주문하면 중앙 물자창고에서 분류해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른바 택배 물품 주문 시스템 같은 ‘구호물자 전달 시스템’ 구축이다.셋째,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소방대원,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대피소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이들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담, 트라우마 해결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좀 더 접근성 높게 다가갈 수 있는 상담·심리치료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변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지역 재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집이 불탔으면 보상금이 아니라 집을 줘야 한다. 임시 컨테이너를 넘어 모듈러 주택 등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예전으로의 복구가 아니라, 지역을 새로 만드는 재건의 시간이다. 6·25전쟁 이후 이런 규모로 국토가 불타는 것은 처음이란 말도 나온다. 어려운 시간이다. 그러나 지역 재건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노인만 남은 산불 피해 현장에서 얻은 교훈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북행복재단 대표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9 hours ago
1
19 hours ago
1


![[아르떼 칼럼] 현대미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인사] 한국환경공단](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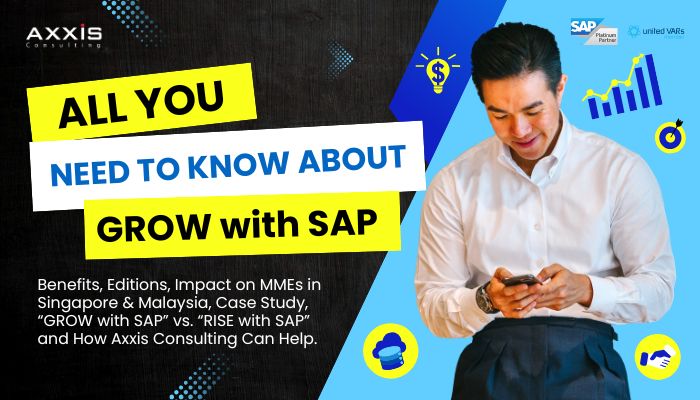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