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의 쿵스가탄 41~43번지 거리에 위치한 콘서트홀(Konserthuset)은 인류의 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장소다. 스웨덴에선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현지시간)을 전후로 일주일간 ‘노벨 주간(Nobel Week)’이 개최되는데, 바로 이곳 콘서트홀에서 ‘노벨 메달’을 수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는 한강에게 노벨문학상을 정식으로 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스웨덴 스톡홀름 쿵스가탄 거리에 위치한 콘서트홀. 1926년 준공됐으며 매년 12월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역사적인 장소다. 한강 소설가도 이곳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김유태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3b83f29a4bdd410e94e9ccbb75a80401_P1.png)
4일(현지시간) 방문한 이곳은 영하 4도의 북유럽 한기가 무색하게도 노벨 주간의 들뜬 열기가 감지됐다.
쿵스가탄 거리에서 만난 토머스 펄손 씨는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상징적인 거리”라며 “12월 10일에 저 안(콘서트홀)에 한 번 들어가보는 게 소원인 친구도 있다”며 웃었다.
스웨덴 시민들은 매년 스웨덴 국영방송인 S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시상식을 가족들이 모여 챙겨볼 정도로 ‘노벨상을 운영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존감이 높다고 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쿵스가탄 거리에 위치한 콘서트홀. 1926년 준공됐으며 매년 12월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역사적인 장소다. 한강 소설가도 이곳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김유태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a5af06989b3948c68490cd3452e96037_P1.png)
이날 스톡홀름 콘서트홀은 정면의 대리석 기둥 10개 사이로 족자 형태의 짙은 파란색 깃발 3개가 웅장하게 걸린 상태였다.
7m도 넘어 보이는 노벨상 황금빛 메달을 프린팅한 천이 정중앙에 놓였고, 그 양옆 천엔 알파벳 ‘THE NOBEL PRIZE’ 선명했다. 시상식을 엿새 남긴 시점이어서 아직은 안으로 들어가볼 순 없지만 대문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 내부에선 인부 몇몇이 짐을 나르던 중이었다.
스톡홀름 콘서트홀 앞 광장의 청동상은 그리스 신화 속 ‘음악과 예술의 신’ 오르페우스를 상징한 작품이다. 조각가 칼 밀레스가 만들었는데 1926년 이곳 콘서트홀의 준공 때 함께 설치된 예술품이다. 콘서트홀 1층은 스웨덴 커피 체인 ‘에스프레소 하우스’가 입점했는데 그래서인지 콘서트홀 인근은 진한 커피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스웨덴 한림원이 운영하는 ‘노벨상 박물관’의 정문. 스톡홀름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12월이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김유태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0c1f0bb85f6a40069ff619308f95d2a5_P1.png)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둘러싼 열기는 콘서트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의 ‘노벨상 박물관’에서도 감지됐다.
콘서트홀에서 남쪽 방향 노르브로 다리 옆 스웨덴 왕궁을 거치면 나오는 노벨상 박물관은 노벨상의 또 다른 상징이다. 노벨 주간인 만큼 박물관 앞엔 플리마켓이 열렸고, 그 옆으로 색색의 비니를 머리에 쓴 유치원생 단체관람객, 70~80대 노년층까지 박물관에 입장 중이었다.
박물관 직원 안니카 씨는 “12월에 스톡홀름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의 목적은 대부분 같다. 노벨 주간을 눈앞에서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를 보며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었는데 “그만큼 한강 소설가의 흔적을 벌써부터 이곳에서 확인하려는 여행객들이 많다”고도 했다. 입장료는 200크로나(약 2만5000원)여서 싸진 않지만 노벨상 시상식 취재 기자들은 무료 입장이 가능했다.
![노벨상 박물관 로비에 전시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안내판. 다른 5개 부문 노벨상 수상자와 나란히 소개 중이다. [김유태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5c7ec8f568f644ee9a5880733d4a790d_P2.png)
입구에 들어서면 반갑고도 익숙한 얼굴이 모든 방문객을 맞이한다. 한강 소설가의 ‘노벨 캐리커처’다.
노벨상 공식 초상화가인 니클라스 엘머헤드 작가가 금박을 입혀 그린 한강 캐리커처가 올해 노벨상 다른 부문 수상자들과 나란히 걸려 있다. 좌측에 3개 부문, 우측에 다른 3개 부문으로 나눠졌는데 한강 작가의 캐리커처는 입구를 등지고 우측 첫 번째에 놓여 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란 2024년 한강 노벨상 선정 사유도 함께 보인다.
한강의 위상은 노벨상 박물관 곳곳에서 감지됐다.
![노벨상 박물관 내부의 모습. 노벨상 수상자들이 기증한 물건들이 전시 중이다. [김유태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d4437432a58c4536a30440aadf31fd36_P1.png)


한강 작가의 정보가 이미 곳곳에 ‘업데이트’됐기 때문이다. 한강은 2020년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욘 포세, 아니 에르노, 압둘라자크 구르나에 이어 안내 패널의 ‘최신’ 수상작가 위치를 장식 중이었다. 입구 바로 왼쪽의 기념품가게에서도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흰’ 스웨덴어판, ‘희랍어 시간’과 ‘채식주의자’ 영문판 등이 이미 책 매대 정중앙 상단을 차지했다. 이곳 점원에 따르면 스웨덴 사람들은 ‘희랍어 시간’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기념품가게의 ‘노벨상 굿즈’를 유심히 보면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18인의 얼굴을 조합한 카드가 눈에 띈다.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121인 가운데 14.9%인 여성 수상자 얼굴만 모은 카드다. 토니 모리슨, 헤르타 뮐러, 나딘 고디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앨리스 먼로, 펄 벅, 도리스 레싱 등이 새겨진 카드엔 한강의 얼굴이 무려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이 카드엔 한강의 소설 4권 제목도 ‘한국어로’ 적혀 있다.

한강 소설가는 6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소장품을 이곳 노벨상 박물관에 기증한다. 기증식은 비공개이지만 기증식이 끝나면 대중과 언론에도 공개된다. 작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는 손으로 꾹꾹 눌러쓴 수첩을 기증했다. 성인 남성의 손바닥 만한 검은 수첩에 노르웨이어로 적힌 욘 포세의 육필은 예술이 탄생하는 순간의 감정을 긴 침묵 속에서 말해주는 듯하다.
특히 이곳 박물관엔 또 하나의 익숙한 얼굴과 이름을 찾아보는 ‘묘미’가 있다.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1년 ‘사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입었던 수의가 전시돼 있기 때문이다. 고 이희호 여사가 붉은실로 직접 짠 뜨개질 신발, 한 달에 한 장의 종이만 허용된지라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써야 했던 김 전 대통령의 편지도 원본으로 전시 중이다. 김 전 대통령의 기증품은 2001년 노벨상 박물관에 기증됐다.

박물관을 나오다 보면 알프레도 노벨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노벨 메달 앞에서 셀카를 찍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계 최고 권위의 메달보다도 박물관 구석 한켠 어두운 구석에 있는 알프레드 노벨의 석고상 한 점은 오히려 잔잔한 감동을 준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죽음의 상인’으로 불렸다지만 그는 부귀를 누리지도 않은 채 ‘인류의 평화’를 갈망하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의 석고상 옆엔 한 장의 종이 사본이 전시 중이다. 1895년 11월 27일 알프레드 노벨이 최종 서명한 유언장이다. 이 종이는 훗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유언장’으로 남게 됐다. 유언장의 ‘노벨문학상’ 부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Den person som inom litteraturen har producerat det utmärktaste i idealisk riktning(문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이상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창작한 사람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한다는 뜻의 스웨덴어).”
스톡홀름 김유태 기자






![43만 찍었다..세븐틴 일본 돔투어 접수 "내년도 함께 하자"[종합]](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307052694758_1.jpg/dims/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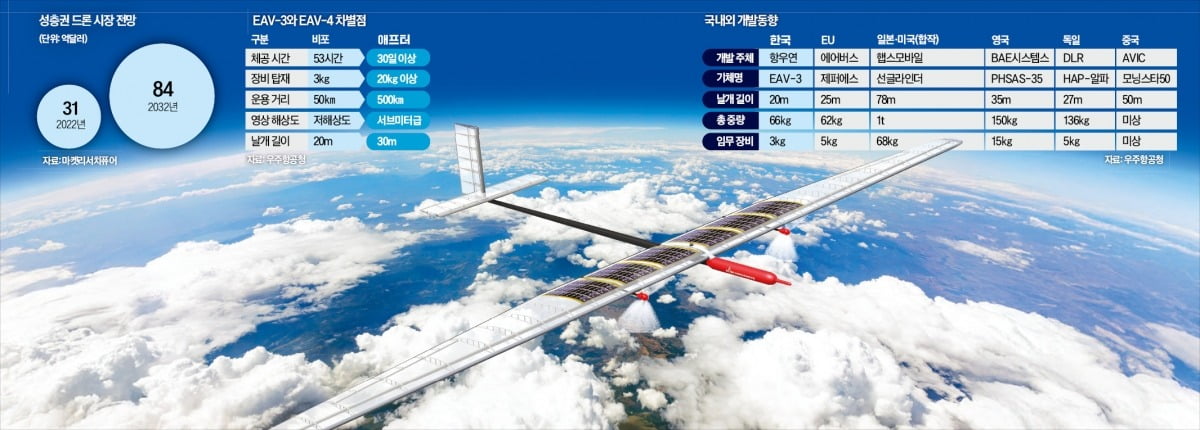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