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칼럼] 의대 증원 사태서 얻은 것과 잃은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40001952.1.jpg)
오래전 지인이 지방에 병원을 열었다. 근처에 여행 간 김에 들렀더니 진료실에 야전침대가 놓여 있었다. 웬 침대냐고 궁금해하니 24시간 환자를 본다는 얘기였다. 바닷가 특성상 밤에도 다치는 환자가 많아 집에 들어가는 날이 손에 꼽는다고 했다. 힘들 텐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환자가 돈으로 보이면 가능하다”는 웃음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그 욕망이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은 높아진 셈이다. 적어도 그 시절, 그 지역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설파한 ‘보이지 않은 손’이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TV의 데이트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가 화제가 됐다. 강원 인제의 개원의인 그는 국회의원에 이어 한국은행 총재에게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는 찬사를 들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은 없느냐는 여성의 질문에 자기가 동네 유일한 의사라 떠날 수 없다고 대답해 감동했다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봤다는 그의 연수입은 5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지역을 지킨다는 이유로 칭송을 받는 건, 의사라면 어디서든 그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의사의 몸값은 치솟지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사의 욕망을 넘치도록 채워줄 수도, 헌신적인 의사를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도 없는 지역은 의료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정부에 의대 증원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으로 맞섰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진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년 증원 0명과 제적이라는 당근과 채찍에 의대생은 대부분 복귀를 택했다. 이제 겨우 한고비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의료개혁이라는 당초 목표는 어느 순간 증발해 버렸다. 이럴 거면 국민과 환자들이 1년 넘게 겪은 고통은 대체 뭐였느냐는 분노가 당연해 보인다.
지난 14개월간의 중간 결산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거의 유일한 소득은 2025학년도에 증원한 1509명이다. 그마저도 지난해 의대 자퇴생이 389명에 달하고 그중 상당수가 올해 다른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론 훨씬 적을 수 있다. 그에 비해 잃은 것은 너무 많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의·정 갈등으로 고통을 겪은 환자들이다. 누군가는 치료를 기다리다가 병을 키우거나 투병 의지를 잃었고, 누군가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거나 목숨을 잃었다. 의대생의 휴학과 1만여 명의 전공의 사직의 후과도 무시 못 할 일이다.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1년 이상 끊긴 건 결국 미래 환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비용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 탓에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주름살도 커졌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우리 사회의 신뢰 자산이 크게 손상됐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 정부의 일방통행에 의사들의 불신은 더 깊어졌고, 사직·휴학의 자유는 외치면서 정작 복귀를 원하는 동료의 자유는 짓밟는 전공의와 예비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도 커졌다. 의료개혁이라는 겹겹의 난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정부, 공급자, 이용자의 상호 불신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재촉할 뿐이다. 나라 안팎이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번에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봉합에만 급급해서는 우리 의료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1 day ago
4
1 day ago
4
![[기고]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113272384885_1.jpg)
![[목멱칼럼]예고된 산불, 미비한 대응체계](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기자수첩] 'AI 을사오적' 되지 않으려면](http://thumb.mt.co.kr/21/2025/03/2025033115261960424_1.jpg)
![[투데이 窓]인공지능이 그리는 '지브리'](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110331442383_1.jpg)
![[人사이트]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 “글로컬 자생력 키워 지역경제·국가 경쟁력에 기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31/news-p.v1.20250331.7cd16f61ea234e1bb26f54d2977dd9cc_P1.jpg)
![[사설]尹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걷히길](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57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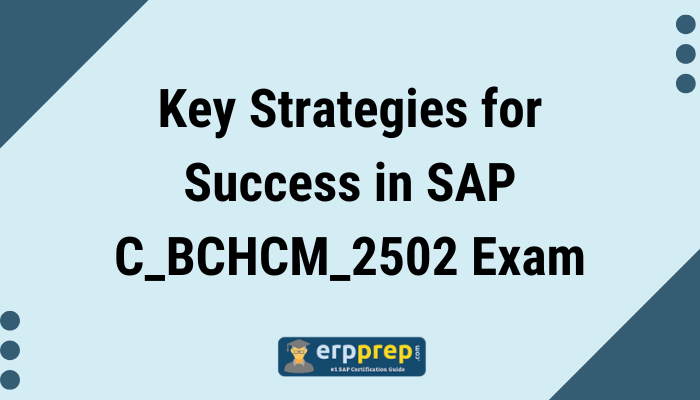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