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미들마켓 시장에서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의 정면 승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럽의 중소형 및 신생 하우스들이 생존 전략으로 눈을 돌린 곳은 다름 아닌 사모대출 시장이다. 사모대출이란 운용사가 사모로 자금을 모아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하거나 사모 회사채, 구조화 상품 등에 투자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전통적 바이아웃(buy out·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후 성장시켜 높은 가격에 되파는 형태의 전형적인 사모펀드 전략)은 자본력이 요구되는 ‘규모의 게임’이 된 반면 중소기업 직접대출을 비롯한 사모대출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펀드로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중소형 운용사들에게 새로운 출구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
| (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 |
과거 사모대출은 중소형보다는 대형 하우스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대출 건당 규모가 크고, 딜 소싱부터 리스크 관리 등 관련 전문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출자자(LP)들 역시 사모대출 경험이 풍부한 대형 하우스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블랙스톤과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KKR 등이 시장을 한때 지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판도가 달라졌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을 빼면서 직접대출 수요가 유럽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면서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의 직접대출은 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펀드로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LP들 역시 중소기업 직접대출이 바이아웃과 달리 펀드 규모에 따라 전략적인 투자를 집행할 수 있고, 펀드 회전율도 빠르다는 이유에서 유럽의 중소형 사모대출 전략에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대형 하우스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모대출 시장에 신생 및 중소형 운용사들이 틈새를 비집고 활발히 진입하는 배경이다.
최근 유럽에서 사모대출 시장에 본격 진입한 운용사로는 런던의 키믹 캐피털과 코린티아글로벌, 키너튼힐캐피털 등이 꼽힌다. 이들 대부분은 대형 투자은행 출신 인력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신생 하우스로, 유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대출 플랫폼과 크레딧 펀드 등을 구축하고 있다.
벨기에의 노스월 캐피털도 최근 16억 유로 규모의 크레딧 펀드 조성에 나섰고, 이탈리아의 중견 운용사인 르네상스 파트너스 역시 올해 초부터 크레딧 전략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지 자본시장에선 중소형 및 신생 운용사들이 앞으로 사모대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엔 사모대출이 대형 하우스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중소형 하우스들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10억 유로 미만의 사모대출 전략은 이제 LP들에게도 전략적인 투자 수단이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직접대출 부문은 대형 하우스가 좀처럼 다루지 못해온 부문이기 때문에 중소형 하우스가 커버할 만한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며 “신생 운용사 입장에선 자신들의 운용 역량을 가장 빠르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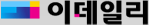 4 days ago
5
4 days ago
5


![[마켓인]석화·이차전지·건설, 신용도 흔들…하반기에도 경고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0101264.jpg)
![[마켓인]준오헤어 "경영권 매각 사실무근"…해외 진출 위한 투자자 물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0101412.jpg)

![[마켓인]"이번엔 될까" MG손보, '정상 매각' 재시동...인수자 찾기 '산 넘어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0101112.jpg)
![[마켓인]넥센타이어 회사채 수요예측에 주문 7배 가까이 몰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7/PS25070101263.jpg)


![천하람 “국민의힘, 죽어버린 나무…물 줄 필요 있나”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02/131732216.1.jpg)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