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고율 관세를 예고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옮긴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태풍의 눈은 무려 46% ‘관세 폭탄’이 떨어진 베트남이다. 이곳에 핵심 생산기지를 구축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정보기술(IT) 기업과 한세실업 등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선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을 줄이고 미국 멕시코 등 북미 생산량을 늘리는 ‘공급망 재편’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내다본다.
◇생산거점 베트남, 인도에 고율 관세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겼다는 점이다.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은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됐다.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동남아 국가들이 활용됐다는 의구심이 세율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을 ‘넥스트 차이나’로 선정해 핵심 생산시설을 구축해온 한국 기업엔 초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에 구축한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45~50%는 베트남 북부 박닌과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나온다. 삼성전자와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매출 81조6553억원을 올렸다. 베트남 매출의 90%가량은 수출에서 나오는데, 상당수가 미국행 선박에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도 베트남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다. 현재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이 베트남에 7개 생산법인을 포함해 총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매출도 적지 않다.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LG전자와 LG이노텍의 지난해 베트남 매출은 11조551억원에 달한다.
26% 관세율이 부과된 인도도 한국 기업의 신(新)생산거점이다. 삼성전자는 수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냉장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LG전자는 노이다와 푸네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만든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인도 법인 매출은 각각 17조489억원, 3조7910억원이었다.
동남아 생산 비중이 높은 한세실업, 영원무역, 세아상역 등 의류·신발 OEM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 생산량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른다. 영원무역은 베트남에 4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애플도 54% 中 관세 직격탄
미국의 관세 폭탄이 한국 기업에만 떨어진 건 아니다.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미국 애플은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만든다. 나머지 10%는 인도,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생산한다. 중국 관세율이 54%에 달하는 만큼 베트남 비중이 큰 삼성전자보다 불리한 셈이다.
산업계에선 미국의 상호관세가 한국 기업에 특별히 불리한 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수요 둔화를 불러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전, 패션 제품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재란 점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상호관세 여파로 스마트폰 가격이 최대 3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 부과가 유예된 멕시코나 보편관세(10%)만 적용되는 국가 중심으로 미국 수출 물량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황정수/민지혜/성상훈 기자 hjs@hankyung.com

 20 hours ago
3
20 hours ago
3



![[ET라씨로] SK하이닉스·삼성전자, 트럼프發 반도체 관세 우려에 동반 하락](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07/mcp.v1.20240207.ea70534bb56a47819986713ff0b3937c_P1.gif)

![[단독] 한화생명, '테크 기반' 美증권사 손자회사로 품는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4/news-p.v1.20250404.696ff7fe8b8047c1bc42a5ac11ac5233_P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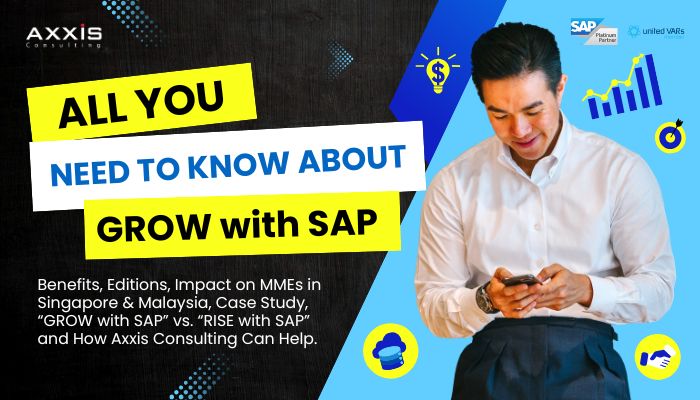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