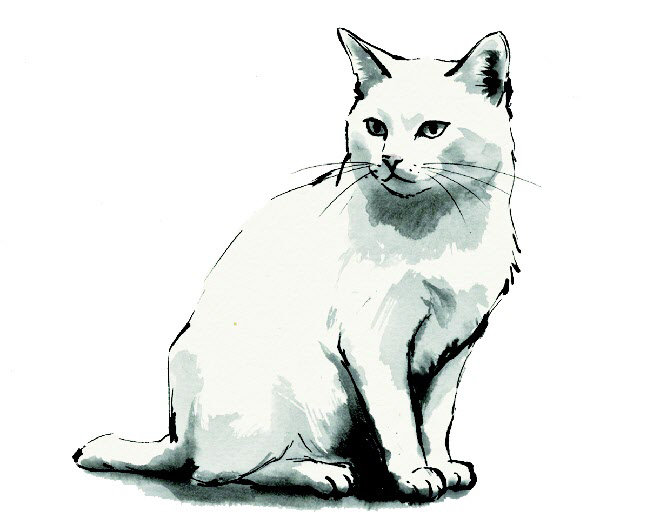
쥐구멍 소탕 하나는 능숙해도, 고기반찬에는 무덤덤하지.
박하잎에 때때로 취하고, 담요 속에서 밤마다 온기를 즐기지.
전생엔 시중드는 아이였을 듯, 산골에서 늙어가는 내 곁을 지킨다네.
(似虎能緣木, 如駒不伏轅. 但知空鼠穴, 無意爲魚餐. 薄荷時時醉, 氍毹夜夜溫. 前生舊童子, 伴我老山村.)
―‘인근 마을에서 고양이를 얻어 설아(雪兒)라 이름 짓고 장난삼아 시를 짓다
(득묘어근촌이설아명지희위작시·得猫於近村以雪兒名之戱爲作詩)’ 육유(陸游·1125∼1210)
쥐를 잘 잡든 반려든 고양이는 인간과 가깝다. 쥐는 양식을 축내기도 하지만 특히 선비들은 장서를 갉아먹는 게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시인에게 고양이는 그 두 역할에 다 충실하다. 녀석은 적적한 산촌 생활에 시동(侍童)처럼 곁을 지켜주는 데다, 쥐잡기에 능숙하면서도 식탐은 별로 없는 제법 품위를 갖춘 반려다. 그래서 설아(雪兒)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다. 털이 눈처럼 하얗고 복슬복슬했나 보다. 녀석은 더러 박하향을 맡으며 환각에 취하기도 하지만 또 ‘담요 속에서 밤마다 온기를 즐기기도’ 하니 마치 주인을 위해 자리를 덥혀주려 배려하는 것도 같다. 전생의 연(緣)까지 거론한 걸 보면 시인에겐 꽤 곰살맞은 존재였던 듯하다.
역대로 육유는 고양이에 관한 시를 가장 많이 남긴 시인으로, 20수가 훌쩍 넘는다. 자신의 또 다른 시에서 ‘부끄럽구나. 집안이 가난하여 포상이 보잘것없으니, 추워도 앉을 담요가 없고 식사에도 생선이 없구나’(‘고앙이에게’)라는 시구를 남기기도 했으니 고양이 사랑이 정말 각별했나 보다.이준식 성균관대 명예교수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9 hours ago
2
19 hours ago
2
![[아르떼 칼럼] 현대미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인사] 한국환경공단](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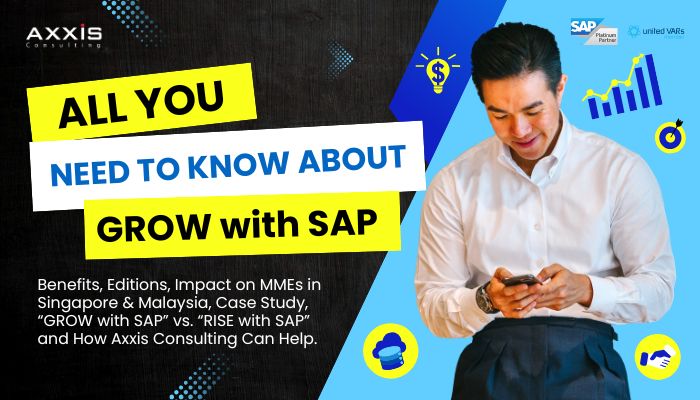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