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작가 에크렘 얄츤다으 인터뷰
학고재 ‘댄스 위즈 핸즈’ 展
수백만번의 붓터치 시도로
종교적인 명상과 수행 완성
말레비치 ‘검은 원’ 오마주
동서양 문명 화폭서 용해돼
![‘자연’ 연작 앞에 선 튀르키예 작가 에크렘 얄츤다으. 말레비치의 ‘검은 원’을 오마주한 듯한 원 이미지의 절대성, 실제 나뭇잎을 대고 찍어 얻어낸 동양화적 화풍이 결합됐다. [학고재]](https://pimg.mk.co.kr/news/cms/202412/02/news-p.v1.20241129.3faca374d9a14f08affaa9a8bc0fe15b_P1.png)
그의 손엔 ‘0호’짜리 세필붓 한 자루가 늘 쥐어져 있었다. 1mm까지도 표현 가능한 독일 다빈치사(社)의 붓이었고, 0호란 붓의 사이즈가 ‘제로(0)’에 가깝다는 뜻이다.
1996년 이후 그의 손을 거쳐간 세필붓 수는 28년간 어림잡아 2만5000자루. 극도의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수만 자루의 붓을 손에 쥐면서 그는 화폭 너머 현실 이면의 근원에 가닿으려 한다.
튀르키예 작가 에크렘 얄츤다으의 개인전 ‘댄스 위드 핸즈(Dance with Hands)’가 최근 학고재갤러리에서 개막했다.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최초로 소개되는 얄츤다으 전시다.
폭설로 한옥 지붕이 온통 하얀 캔버스처럼 변해버린 서울 삼청동의 학고재갤러리에서 지난 27일 오후 만난 얄츤다으 작가는 “내 붓은 매우 가늘지만 내 그림은 세상에 ‘결여’된 뭔가를 보완하려는 의식(儀式)적 행위에 가까웠다. 내 그림을 보는 시간을 종교적, 명상적이라 해도 좋다”며 입을 열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그라데이션 색상의 캔버스가 여럿 보인다. 2024년작 ‘색에서 색으로’가 대표적이다. 밝은 무지개 원색의 그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일한 물감이 아닌, 꽃잎 모양의 형상을 얇은 붓으로 하나씩 그려 전체를 구조화한 것이다.
꽃잎 하나마다 스무 번 이상의 붓터치가 지나갔음을 가늠하면 이 그림은 숭고해 보이기까지 한다. 캔버스마다 꽃잎이 수천 수만 개. 캔버스 하나를 완성하는 과정의 수고가 짐작된다.
“그림 속의 각 칸은 꽃잎, 세포, 지문으로도 볼 수 있다. 가는 붓을 사용해야 특수한 형태를 부여할 수 있다. 모든 작가들처럼 나 역시 나만의 회화적 도구를 찾으려 애썼다. 나는 0호짜리 붓으로 나의 세계를 갈망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반복성’이란 점에서 얄츤다으 그림은 21세기의 현대판 만다라를 연상시킨다. 특정 종교가 아닌, 종교적 수행(修行)에 가깝다는 의미다. 그러나 캔버스에 축적된 작가의 무수한 손길만이 숭고성의 조건은 아니다. 캔버스에 남겨진 원(圓)의 이미지는 작품의 깊이를 강화한다.
가령 ‘자연(Natures)’ 연작에는 3개의 원이, ‘마젠타 바이올렛’와 ‘바이올렛-오렌지’엔 반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 즉 동심원이 그려졌다. 묘사로서의 회화성이 배제된, 절대적인 원이다.
얄츤다으의 원은, 한 세기 전 미술사의 흐름을 역류시켰던 카지미르 세베리노비치 말레비치(1878~1935)의 ‘검은 원’의 오마주라는 느낌이 강하다. ‘검은 원’이 등장한 때가 1924년이었으니, 얄츤다으의 이번 작품은 100년 만에 다시 그려진 원인 셈이다.
“미술이란 한 작품 안에 문학, 철학, 음악의 요소를 전부 담아내는 하나의 방식이자 태도다. 회화는 모든 것을 한 캔버스에 함축해 한번에 보게 만든다. 캔버스는 그 자체로 소통하는 창구다.”
얄츤다으의 방한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그의 명성은 이미 전 유럽에서 드높다. 이는 단지 그가 현대미술 거장 헤르만 니치를 사사한 제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동서양 문화의 십자로’인 그의 모국 튀르키예의 정체성이 얄츤다으 화폭에 오롯해서다.
예를 들어 서양의 회화 기법인 유화기법과 실크스크린, 그리고 동양의 서예를 연상시키는 붓터치가 결합되기도 한다. 놀라운 점은 ‘자연’ 연작의 경우 실크스크린 작업 과정에서 실제 나뭇잎을 대고 찍었다는 점이다. 서예처럼 보이는 건 그래서다. 두 문명이 백지 캔버스 위에서 한몸으로 용해된다.
“에른스트 곰브리치는 예술가를 두 그룹으로 나눠 설명했다. 하나는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룹, 또 하나는 이 사회에 뭔가가 결여돼 있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려는 그룹이다. 난 명백하게도 후자다. 사회에 빠진 부분이 뭔지를 붓으로써 채우려 한다.”
얄츤다으 작가는 튀르키예와 독일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베를린에 갈 때마다 그는 다빈치사 0호 붓(‘다빈치 노바 시리즈 1570’)을 적게는 500자루, 많게는 1000자루씩 한꺼번에 구매한다. 하다 많이 사들이다 보니 이젠 아예 다빈치사 대표가 그에게 붓의 사용감과 개선점을 묻기에 이르렀단다.
“캔버스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돌을 처음부터 굴려야 하는 시시포스가 된다. 시시포스는 저승에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은 신화 속 인물이다. 시시포스에게 그 행위는 고통이었겠지만, 나는 시시포스적 움직임을 통해 나 자신의 도약을 꿈꾸려 한다.”
전시는 28일까지.





![43만 찍었다..세븐틴 일본 돔투어 접수 "내년도 함께 하자"[종합]](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307052694758_1.jpg/dims/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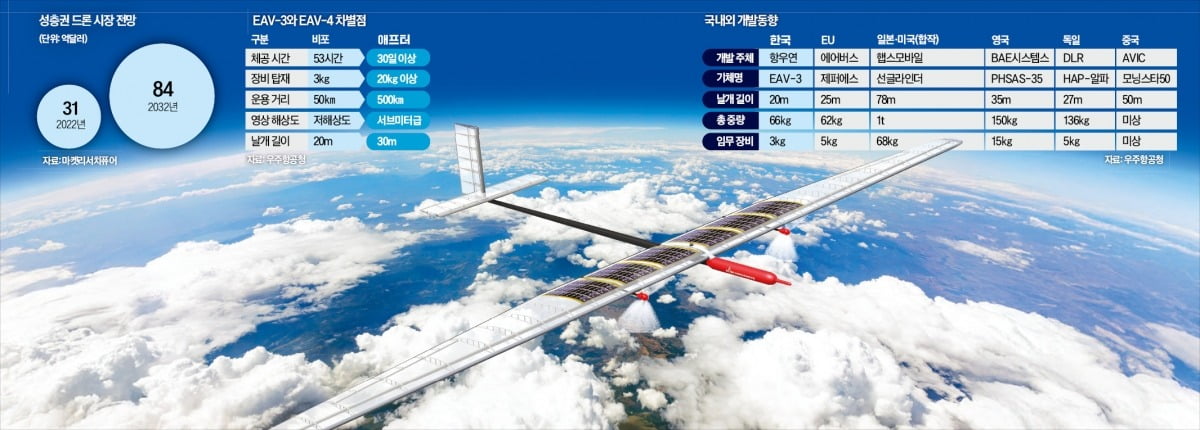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