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 아침 낡은 거울 들여다보니, 객지살이에 얼굴은 쇠약한 노인 꼴.
느긋하게 살아가기란 정말 어렵고, 나와 관련된 일 대부분은 허망하기만.
덧없는 인생 얼마나 살랴. 한바탕 봄바람에 취해나 보세.
(一月月相似, 一年年不同. 淸晨窺古鏡, 旅貌近衰翁. 處世閑難得, 關身事半空. 浮生能幾許, 莫惜醉春風.)
―‘새해 친구에게 드리다(신년정우·新年呈友)’ 허당(許棠·822∼?)
하루하루는 감지할 겨를 없이 훌쩍 지나고 한 달 한 달도 고만고만하게 흐르는 듯한데 유독 해가 바뀔 즈음이면 세월의 급박한 속도를 실감한다.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 관습이나 역사가 된다면 그걸 하루, 한 달, 한 해 단위로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단지 ‘모든 어제들’의 축적일 뿐인 것을. 그렇대도 한 해의 끝자락이나 첫머리에 서면 우리네 마음은 괜히 뒤설렌다. 삶의 리듬에 변화를 주고 한 번쯤 궤도를 벗어나 보자는 저돌적인 작심으로 달뜨기도 한다.
새해 아침 시인은 거울 속 자신의 쇠약해진 모습을 발견하고는 친한 벗을 떠올린다. 다급한 세월의 보폭에 맞추느라 허방지방 살아온 나날, 자신이 기대하고 또 실천했던 일들이 대부분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끝났다는 허탈감. 인생 소회가 실로 씁쓸하다. 그렇다 해도 시인은 친구에게 어리석었던 전철(前轍)을 성찰하자고 권유한다. 술 한잔 나누며 맘껏 봄바람을 즐겨 보자는 훈훈한 다짐을 내보인다. ‘덧없는 인생 얼마나 살랴’는 말은 결코 비관 속 한탄일 수 없다.이준식 성균관대 명예교수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4
1 week ago
4
![[고양이 눈]생활예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69731.5.jpg)
![최고권력자도 탐한 명화[이은화의 미술시간]〈354〉](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69714.5.jpg)
![일제강점기 경성에 퍼진 反中 감정… “화공이 조선인 일자리 빼앗아”[염복규의 경성, 서울의 기원]](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72159.1.jpg)
![[한경에세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기고] 모험투자시장 이대로 괜찮은가](http://thumb.mt.co.kr/21/2025/01/2025011415295843680_1.jp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근처 갈 만한 커피숍 알려줘"…'이 번호' 누르자 챗GPT가 받았다 [송영찬의 실밸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395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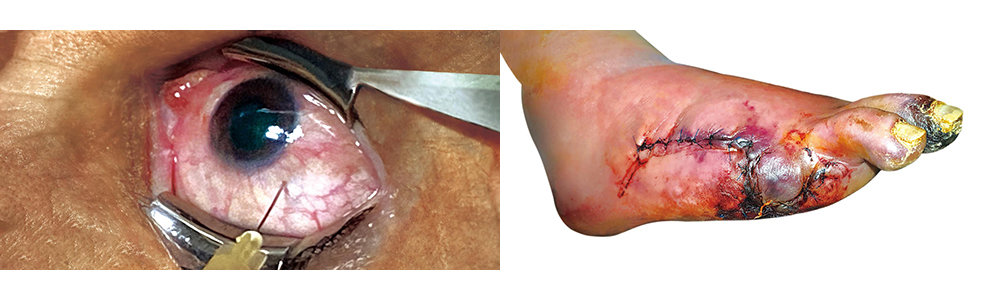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