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빛을 투사하여 스크린 위에 영상을 띄우는 2차원의 매체다. 뛰어난 감독들은 영화가 지닌 평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어떻게 3차원의 물질성을 부여할까' 입체적인 고민을 거듭한다. 관객이 스크린 속 인물의 감정에 이입하고 영화가 묘사하는 사건과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꾸민다. 그에 맞춘 형식을 고안한 게 흔히 말하는 '체험의 작품'이다.
포르투갈 출신의 미겔 고메스 감독이 만들어 지난해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그랜드 투어>도 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제목의 ‘그랜드 투어’는 1900년대 초반 제국주의 시절 유럽의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아시아 대륙 횡단 여행을 뜻한다. 미겔 고메스는 윌리엄 서머싯 몸의 단편 <응접실의 신사>에서 영감을 얻어 결혼을 피하는 남자와 이를 쫓는 여자의 행보를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 등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투어에 담았다.


남자와 여자의 사연이 펼쳐지기 전 등장하는 오프닝은 회전차에 할애된다. 런던아이와 같은 현대식과 다르게 리어카에 설치된 이 회전차는 인력(人力)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이 각자의 좌석에 앉아 있으면 두어 명의 일꾼들이 그사이를 오가며 '곡예'하듯 회전차를 운전한다. 대개 오프닝은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축해 보여주기 마련인데 <그랜드 투어>에서 왜 회전차를 첫 장면에 배치했는지는 미겔 고메스의 인터뷰에서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 성별, 시대, 현실과 상상, 세상과 시네마 등 분리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투어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었다. 그게 바로 시네마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장면의 회전차는 별개인 듯 해도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결된 세상에 관한 은유이자 이를 필름에 담아 영사기로 돌려 영상으로 투사하는 시네마의 원리이다. 세상이, 영화가 ‘돌아가는’ 이치가 첫 장면의 회전차에 담겨 있다.
세상을 구성하는 건 사람들의 활동이다. 개인과 개인의 인연은 원을 그리며 관계로 확장하고 관계는 역사를 생성하여 돌고 돈다. <그랜드 투어>는 영화에 이 원리를 담아낸다. 눈여겨봐야 하는 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에 관한 의견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사건보다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설계하는 모습, 즉 쫓고 쫓기는 구도가 그리는 원의 형태와 이 안에 카메라가 담아내는 풍경이다.
미겔 고메스는 영화를 촬영하기에 앞서 촬영감독, 각본가와 함께 그랜드 투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코스를 여행하며 카메라로 해당 국가의 다양한 이미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이 아카이브에는 아시아 각국의 인형극, 오토바이 행렬, 투계장, 노래방 등 21세기의 풍경이 담겨 있다.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는 <그랜드 투어>의 극 중 시간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존이 불가능하다.

이 설정은 미겔 고메스가 시공을 초월하는 영화 매체의 특징을 드러내려는 의도이다. 현실에서라면 이루어지기 힘든 20세기와 21세기의 동시간대 조합이 <그랜드 투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남자와 여자의 멜로 드라마이면서 다큐멘터리 문법에 기반한 풍경 이미지가 펼쳐지고, 아련한 흑백 영상을 선보이면서 극 중 남녀가 이동하는 국가의 해당 언어를 내레이션으로 활용해 건조한 기록 화면의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어울리지 않는 것, 서로 함께하기 힘든 짝, 극단에 있는 존재처럼 마주하기 힘든 여럿을 하나로 엮는 미겔 고메스의 연출 솜씨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제시된 회전차를 수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꾼의 ‘곡예’를 연상하게 한다. 미겔 고메스에게 영화 만들기란 CG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기존의 것들을 찾아내고 이를 창조적으로 조합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수공업에 가깝다.

극 중 남과 여가 각각 쫓기고 쫓아야 했던 이유, 이를 영화와 미겔 고메스의 관계로 사유를 넓히면 이제는 점점 희박해지는 고전적인 영화 만들기와 어떻게든 이를 되살리려는 감독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흔히들 말하는 영화의 죽음은 미겔 고메스에게 새로운 영화의 시작이다. 그처럼 <그랜드 투어>는 여자가 죽음으로 어둠을 맞이한 후 다시 눈을 떠 빛을 보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관객은 돌고 도는 세상의 당연한 조리(條理)를 극 중 회전차의 원리로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새벽과 황혼 녘의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을 흑백의 필름으로 대리하여 경험한다. <그랜드 투어>의 시간은 영화로만 머무르지 않고 관객이 존재하는 현실과 맞닿아 스크린과 객석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그럼으로써 영화는 세상이 되고, 세상은 영화가 된다. 세상과 영화로 떠나는 이 여행(tour)은 그래서 위대하고 원대하고 굉장하다(grand).
허남웅 영화평론가
[영화 <그랜드 투어> 메인 예고편]

 1 day ago
2
1 day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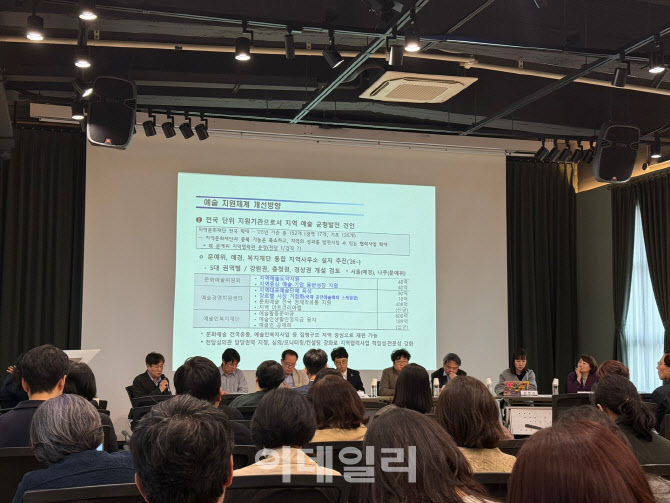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