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지방의회 사용설명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39705237.1.jpg)
행복에도 순위가 있다. 매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HR) 결과에 따라 ‘행복한 국가’의 순위가 매겨진다. 올해 한국은 세계 144개국 가운데 5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보고서 속 내 시선을 사로잡은 순위는 따로 있었다. 평균보다 아래인 84위를 차지한, ‘어려울 때 도움 청할 곳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지원 항목이었다.
올해 세계 행복보고서는 외면하고 싶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담고 있었다. 소득이나 건강, 기대수명과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복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섰지만 정작 절박할 때 도움 청할 곳이 없어 헤매야 하는, 내적 행복은 빈약해진 우리의 현주소가 그 안에 있었다. 이 역시 나의 고질적 직업병일지도 모르겠다. 실망스러운 한국의 행복 성적표에서 여전히 빈약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현실이 겹쳐 보였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고 4년 후 지방의회가 부활했다. 이후 34년이다. 수많은 곡절 끝에 부활은 했으나 독립은 아직이다. ‘서른네 살 지방의회’는 최소한의 인사(人事)만 주관할 뿐 여전히 집행기관이 짜주는 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운영한다. 제 앞가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홀로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다. 태생부터 ‘강(强)시장-약(弱)의회’법인 지방자치법 때문이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독립해 보려 했지만, 국회 출범 때마다 발의되는 지방의회법은 매번 표류하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다.
지방자치의 독립선언이 미뤄질수록 시민이 지방의회를 제대로 알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학교는 지방의회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사회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충분히 조명하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교과서의 맨 귀퉁이, 단 몇 줄의 설명으로만 존재했다.
그런 탓에 시민들은 어려울 때 기꺼이 곁을 내주고 삶의 빛이 돼 줄 손길을 곁에 두고도 써먹지 못했다. 애당초 지방의회는 시민 곁에서 삶의 볕이 돼주라고 만들어진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언제나 시민의 손이 닿는 곳에서 조례로, 예산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시민이 들려주는 사소하고 소박한 질문에 성심껏 응답하는 그곳이 바로 지방의회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현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발로 뛴다. 현장에서 역사의 초고를 새로 쓰는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지방의회 사용설명서를 쓴다. 말이나 글이 아니다. 보통의 일상 한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지방의회의 쓸모를 설명한다.
나의 이 노력이 한낱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꿈꾼다. 지방의회를 통해 시민의 행복 초상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냐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서울시의회를 가리키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10 hours ago
2
10 hours ago
2
![[MT시평]주민자치 실질화하는 개헌해야](http://thumb.mt.co.kr/21/2025/04/2025042716402051327_1.jpg)
![[투데이 窓]협상의 기술은 이론전 아니라 심리전이다](http://thumb.mt.co.kr/21/2025/04/2025042816084878531_1.jpg)
![[사설]국힘 후보 金-韓 압축… 집권 청사진은 언제 내놓을 건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29/131520209.1.jpg)
![[김승련 칼럼]대통령 최측근들의 집단적 ‘불고지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29/131520192.1.jpg)
![[횡설수설/신광영]‘블랙 아웃’… 19세기로 돌아간 스페인-포르투갈](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29/131520183.1.jpg)
![[오늘과 내일/장원재]‘혐중 시위’ 막을 ‘카운터 시위’가 필요하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29/13152017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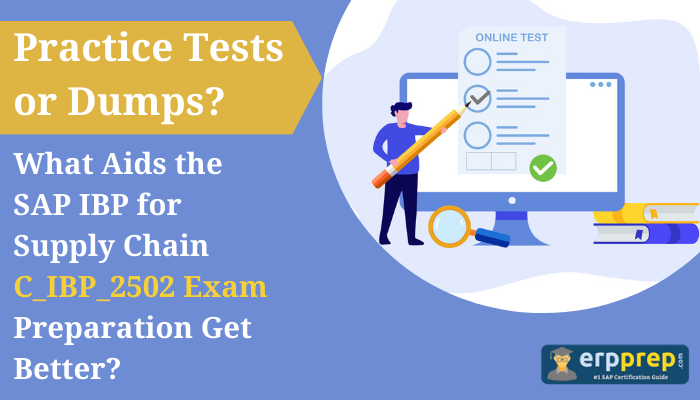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