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대학 졸업장은 받았지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39673977.1.jpg)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웃으며 캠퍼스를 떠나는 순간을 매년 지켜본다.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어쩔 수 없는 불안이 깃들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그들의 가슴속을 파고든다. 더 이상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유효하지 않다. 성실한 노력도, 뜨거운 열정도, 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청년들은 지금 공정하지 않은 현실 앞에 서 있다.
202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대학 졸업 청년들의 취업률은 45%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청년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일자리조차 얻지 못한 채 사회 진입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압박, 불확실한 미래가 한꺼번에 그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우리는 청년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설 무대는 좁아지고 있다. 왜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는가? 그 해답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이 기업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속속 미국, 베트남, 인도 등지로 떠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이다. 한국은 이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문제의 핵심은 엄격한 규제다. 한국 사회는 변화보다는 통제를, 유연성보다는 획일성을 선택해왔다. 새로운 산업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각종 규제가 그 싹을 자른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같은 서비스는 제도라는 이름의 철문 앞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 기술은 준비돼 있었고 수요는 분명했지만, 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버가 허용된다면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해외 출장객들이 애용하는 이 서비스는 택시보다 30% 이상 저렴하고, 유휴 자산을 활용하는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이다. 호주는 우버를 도입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기존 택시산업에 기부하도록 해 신구 산업 간 균형을 이뤘다. 한국은 그 기회를 외면했다. 규제는 산업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폐쇄의 논리로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단지 일자리 숫자가 아니다. ‘규제 국가’라는 낡은 틀을 깨뜨려야 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청년도 다시 꿈을 꿀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그들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은 사회의 가장 생생한 가능성이다. 우리는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야 한다. 시작은 명확하다. 기업이 돌아오고 머물고 자랄 수 있는 나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규제의 시대’를 넘어 ‘기회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2 days ago
9
2 days ago
9
![[부음] 안동범(前 전자신문 이사)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전문기자칼럼] ''여행''은 외교적 자산이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광화문]"역사는 반복된다" 또 야만의 시대](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09002554563_1.jpg)
![[기고]지급결제의 혁신, 스테이블 코인](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06053928075_1.jpg)
![[우보세]선거 재테크](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505760212_1.jpg)
![[기자수첩] 정년연장, 선택이 아닌 필수](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407412534340_1.jpg)
![[MT시평]4년 중임제, 주의할 점](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340233047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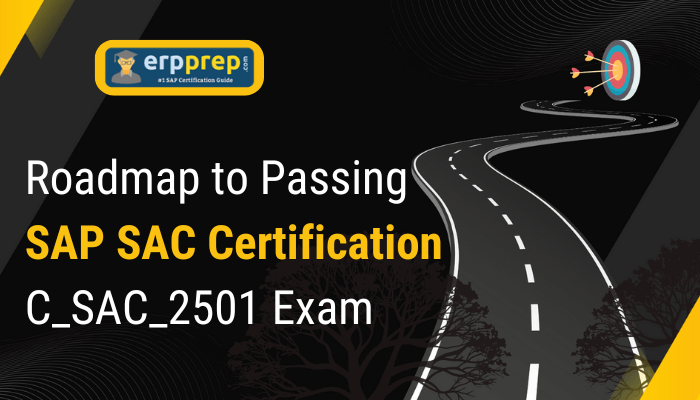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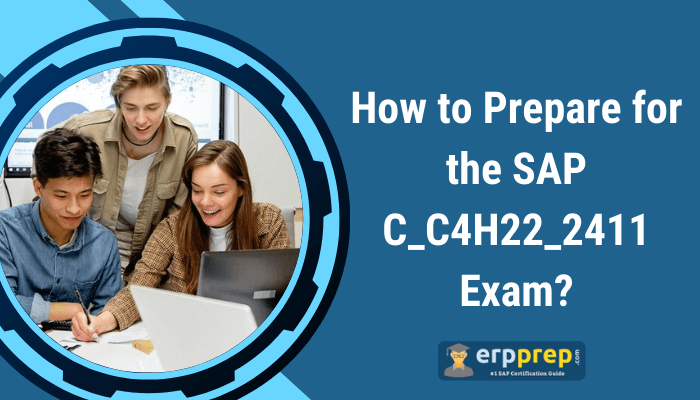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