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감독상 등 5개 부문 시상
‘황금동백상’ 같은 독특한 이름 필요
신작 유치-유통-홍보 반전 기대
공정한 심사 뒷받침돼야 재도약

1996년 시작된 BIFF가 올 9월 열리는 30회에서 그간의 비경쟁 원칙을 접고 경쟁 체제로 전환해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한다. ‘축제형 영화제’를 지향했던 기존 운영 방식을 바꿔 본격적인 개편에 나선 셈이다. 잇단 내홍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인한 영화시장의 경쟁력 약화 속에서 BIFF가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개막작 수난에 OTT 역습까지
최근 BIFF는 명성에 비해 실속이 예전만 못하다는 논란에 자주 휘말렸다. 특히 개막작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는 관객 6만 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개막작 ‘전, 란’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란 점에서 “영화제 본연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 영화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작은 영화제의 방향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얼굴”이라며 “경쟁 체계가 없다 보니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대감을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BIFF가 경쟁 부문을 신설한 배경에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도 작용했다. 팬데믹 이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가 제작과 유통의 주도권을 쥐면서 기존 영화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에 영화제도 영화 상영만으로는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기 어려워졌고, 평가 체계를 갖춰 권위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영화제작사 관계자는 “비경쟁 구조를 유지해 온 BIFF는 초청작에 수상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유통 시장과 홍보에서 불리했고, 신작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했다.
게다가 2023년 인사 갈등과 집행위원장 사퇴, 성추행 논란 등이 겹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은 점도 한몫했다.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BIFF로선 ‘대변신’이 절실해진 것이다.● ‘황금동백상’ 같은 매력 포인트 살려야신설되는 경쟁 부문은 대상과 감독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심사위원특별상 등 5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대상 수상작은 폐막작으로도 상영된다. 신인 감독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뉴커런츠’보다 한층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구조다.
박광수 BIFF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칸이나 베니스 같은 글로벌 영화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계적 경쟁 영화제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BIFF의 변화 시도에 영화계 인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이제는 경쟁 없는 영화제는 주목받기 어렵다”며 “BIFF에서 받은 상이 시장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면 BIFF의 영향력도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영화제 마케팅 면에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에 ‘황금동백상(Golden Camellia Prize)’ 같은 근사한 이름을 명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동백꽃은 부산의 시화(市花)이기도 하다.
다만 제도 개편만으로는 신뢰도를 회복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시선도 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관객 친화적 축제’ 이미지가 경쟁 중심으로 바뀌면 훼손될 수 있단 우려다. 특히 경쟁 부문을 운영하며 심사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영화제는 더 크게 흔들릴지도 모른다.정지욱 영화평론가는 “경쟁 부문이 생긴다 해도, 칸이나 베니스에 진출하지도 못한 작품이 수상하는 구조라면 권위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인적 쇄신 등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아시아 영화의 허브로서 BIFF가 쌓아온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hours ago
2
2 hours ago
2
![트렌드지 "이 갈고 준비한 앨범… 음방 1위 목표" [인터뷰]③](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600013.jpg)
![트렌드지 "런던 웸블리·뉴욕 타임스퀘어 무대 꿈"[인터뷰]②](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600012.jpg)
![트렌드지 "오점 없는 앨범… '카멜레온' 만족도 95점!" [인터뷰]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600004.jpg)
![강은비 악플 고백 눈물 "안티팬 계란세례+남동생 왕따"[스타이슈]](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5/2025050513472153710_6.jpg/dims/optimize/)
![제대로 물 만난 30대 박보검..못하는게 뭐에요 [★FOCUS]](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5/2025050316063269155_1.jpg/dims/optimize/)
![[오늘의 운세/05월 06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5/05/13154804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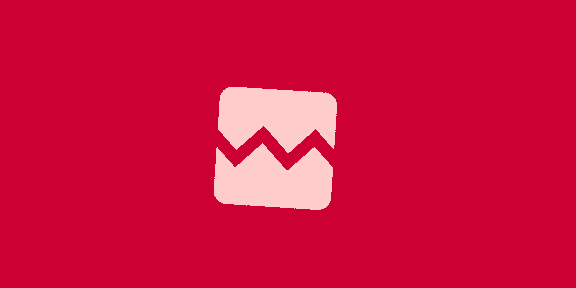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