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신·김창억·홍순명·스콧 칸
‘숭고한 시뮬라크라’ 그룹전
3월 15일까지 리만 머핀에서

캔버스에 그려진, 한 마리의 새를 상상해보자.
눈앞의 새를 보지 않은 채로, 그저 상상만으로 그린 캔버스 안의 새다. 이 그림 한 점은 철학적으로 문제적이다. 왜 그런가.
본래 회화란 대상을 모방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했고, 이 모방은 언제나 재현(在現)을 전제 삼는다. 즉, 원본이 있어야 가능한 장르다. 그런데 실재하지 않는, 원본 없는 대상을 ‘상상만으로’ 그렸다면 캔버스 자체는 현실 너머의 초현실이란 문제를 형성한다.
22일 만난 예술평론가 앤디 세인트 루이스는 이를 두고,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simulacre·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 개념을 빌려 “현실의 재현이 아닌, 현실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현실이 아닌 영역은 언제나 문제가 된다. 시뮬라크르에 기반한 예술은 현실을 재창조하고 보는 이에게 비현실적 경험을 준다”고 설명했다.
루이스 평론가가 기획한 국내외 작가 4인의 그룹전이 22일 서울 이태원 갤러리 리만머핀에서 개막했다. 김윤신, 김창억, 홍순명, 스콧 칸의 작품을 한 자리에 선보이는 전시로 이번 그룹전 키워드는 ‘대상으로서의 원본을 넘어선, 현실 너머의 풍경화’이라 할 수 있겠다.
풍경을 그렸지만 실재하는 풍경이 아닌 회화들이 두 개 층의 하얀 벽에서 차례대로 관객을 맞는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은 홍순명의 2024년작 ‘저기, 일상-241261’이다. 이 작품은 온 세상을 까맣게 태워버릴 듯한 검붉은 노을 아래 수십 마리의 새가 그려졌다. ‘분명히 저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맹렬한 색감의 하늘 아래, 강가에서 밤을 준비하는 새떼들의 여유는 서로 대조를 이뤄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때 홍순명의 ‘저기, 일상’ 시리즈는 작가가 촬영한 사진에 기반하는데, 캔버스에 그려진 풍경은 그곳이 실재하는 장소임에도 실재의 재현이 아니란 점에서(원본은 ‘사진’이므로) 물리적 현실과 관념적 회화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게 한다.

김윤신의 2012년작 ‘내 영혼의 노래 2012-37’도 모방이나 재현과는 거리가 멀다.
오랜 기간 자연을 소재로 삼아 외길을 걸어온 그는 이번 전시에 소개된 회화에서 주로 나뭇잎을 선보인다. 그러나 나뭇잎을 똑같이 그리는 대신, 그 나뭇잎의 본질을 그렸다는 점이 기존 회화의 문법과 차별화된다.
시각적인 대상으로서의 나뭇잎 본질은, 그것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시시각각 색이 변한다는 점,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서로 다른 잎맥을 지닌다는 점일 텐데, 각각 다른 색과 모양으로 이뤄진 김윤신의 나뭇잎은 자연물의 모방 혹은 재현을 겨냥하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상상하도록 이끄는 힘을 내재하기 때문이다.

김창억의 1989년작 ‘추상 풍경 No.2’은 굵은 경계선에 특히 주목하게 된다.
깍아지른 절벽과 둥근 언덕, 그리고 구름과 나무 등 김창억의 눈에 비친 자연물은 각각이 굵은 선으로 전부 구획돼 있다. 현실의 모든 대상에겐 경계선이 없으므로 캔버스 속 대상은 실재하는 풍경과 다르지만, 그는 실제 풍경을 복제하려는 욕망이 없다는 듯이 경계선으로 독특한 미감을 형성해냈다.

스콧 칸의 2000년작 ‘키플링 가든’은 저곳이 실재하는 장소인가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상상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른 3인의 작가와 더 차별화된다. 전시된 그의 작품에 드러난 길, 문, 그림자는 그 자체로 관객에세 새로운 상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자연스러운 풍경인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중력이 왜곡된 듯이 원근이나 부피감이 묘하게 뒤틀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캔버스에 담은 그의 질문을 감각하게 된다.
전시는 3월 15일까지.

![[포토] 깨비 김한나의 건강미](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1/2025012220424886869_1.jpg/dims/optimize/)

![[포토] 김한나 '귀요미 도깨비'](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1/2025012220405597739_1.jpg/dims/optimize/)
![[포토] 강성형 '감독의 박수는 선수를 춤추게 한다'](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1/2025012220385853384_1.jpg/dims/optimize/)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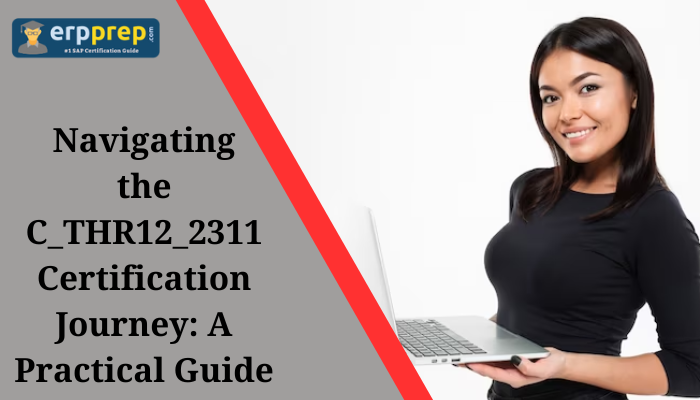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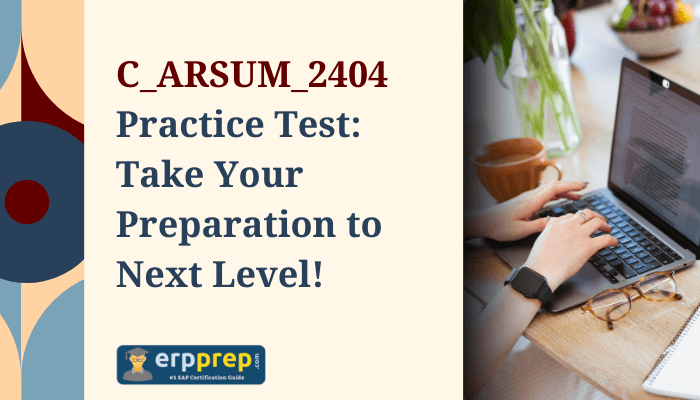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