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젊고 유망한 연구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변화의 목소리가 만드는 스포츠의 밝은 내일을 칼럼에서 만나보세요. 
지난 1월 당선된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사진=뉴시스
올해 선거는 특히 주목을 끌었다. 오랜 기간 체육계를 지배하던 구체제가 막을 내리고, 젊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지도자가 회장직에 오르면서 세대교체와 변화를 상징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선거에서 바뀐 것은 인물이지 제도는 아니다. 여전히 간선제가 유지됐고, 선수와 지도자의 목소리는 제한적이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새 지도부의 출범 이후 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과연 선거 방식의 개선만으로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권력의 견제가 부재한 채 선거가 단순한 정당성 확보의 절차로만 기능한다면,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
| K-pop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미 세계적 위상을 확보한 한국이 이제 스포츠 거버넌스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퍼플렉시티 AI 생성 |
대한체육회는 구조적으로도 복합적이다. 정부 재정을 지원받으면서도 자율성을 내세우고, 동시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는 선거가 형식적 합리성을 띠는 동시에 실질적 책임성을 결여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낳아왔다. 이번 지도부 교체가 갖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어렵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 기구들 역시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나, 부패와 기득권의 재생산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 한국의 체육계가 직면한 선거 제도 논의는 곧 세계 스포츠계 전체가 마주한 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K-pop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미 세계적 위상을 확보한 한국이 이제 스포츠 거버넌스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제도적 선진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개혁은 한 조직의 규정 개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국가를 넘어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라는 독특한 공적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그 과제를 감당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
| 대한축구협회장 4선에 성공한 정몽규(오른쪽) 회장이 신문선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주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고,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협상이다. 대한체육회의 선거제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단지 ‘더 나은 제도 설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을 묻는 정치적 상상력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스포츠계에 필요한 것은 제도적 공학이 아니라, 88년 이후 고착화 된 스포츠계의 민주주의를 다시 사유하는 용기다.
결국 이번 논의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절차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실질을 만들어야 하는가’ 대한체육회의 개혁은 이 물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답이자, 세계 스포츠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18 hours ago
8
18 hours ago
8



![컵스의 실패한 선발 3일 휴식 카드...밀워키, 1차전 대승 [NLDS]](https://pimg.mk.co.kr/news/cms/202510/05/news-p.v1.20251005.8da7abc58d4140cd8f92a4ee1f66c9a0_R.jpg)
![1139일 만에 출전, 1부 무대 밟은 ‘안양 원클럽맨’…“안양 = 가족, 이런 가족 또 어디 있으리” [김영훈의 슈퍼스타K]](https://pimg.mk.co.kr/news/cms/202510/05/news-p.v1.20251005.441e61932c3948018a0d7f39d9037989_R.jpg)
![“불확실한 내야 상황, 팀에 도움될 것” 로버츠 감독이 말하는 김혜성 활용 방안 [현장인터뷰]](https://pimg.mk.co.kr/news/cms/202510/05/news-p.v1.20251005.3383ab9de23c4b008390d9534cdeca6d_R.jpg)

![“3차전 선발? 2차전까지 해보고 정한다” 필라델피아의 선발 계획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10/05/news-p.v1.20251005.00778e6639e249c98b8048038e2e460f_R.jpg)




![[단독] 만취해 운전대 잡은 30대 여성…중앙선 침범해 택시와 충돌](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JYP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 손 잡는다…“K팝 기회 살리려 결심” [이번주인공]](https://pimg.mk.co.kr/news/cms/202509/14/news-p.v1.20250910.34b4477db9874ff8a7eb9cb0d1087d7d_R.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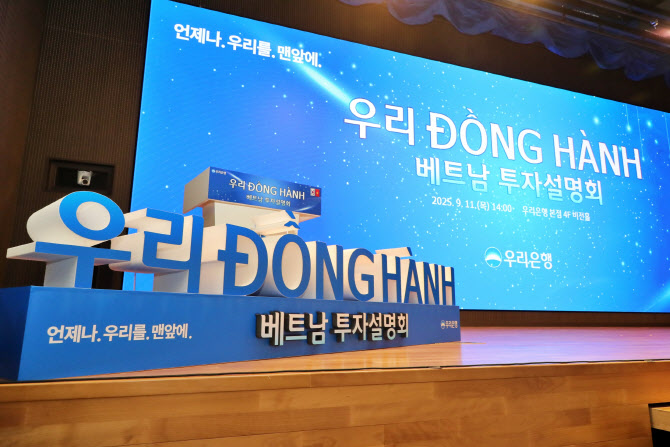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