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깊은 땅속을 파헤치고 들어간 아이들, 세상을 누비고 느끼던 모든 작은 것들아, 깊숙이 떨어져 내린 태양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잎들이 다시 푸르러질 때까지, 참아 내거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북극권에 걸쳐 있는 핀란드의 작곡 거장 시벨리우스의 극음악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는 숲에서 길을 잃었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가의 신부가 된 여인의 불행을 그린다. 마지막 장면에서 여주인공 멜리장드는 작디작은 아이를 낳고, 혼미한 의식 속에서 지금이 겨울이냐고, 춥다고 말한 뒤 죽어간다. 이 장면의 음악 ‘멜리장드의 죽음’을 듣고 있으면 한기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다.
기운을 내기 위해 역시 북유럽의 거장인 노르웨이인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으로 분위기를 바꾸기로 하자. 혼자서 나름의 상상에 빠져 본다. 해변에 있는, 커다란 통유리 창이 있는 곳, 그런 데서 커피 한잔을 놓고 앉아 있다. 창밖은 춥겠지만 청량한 북유럽의 파란 하늘에서 햇살이 비치고,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창에 부딪칠 듯 날아다닌다.지난 주말처럼 올겨울엔 눈이 많이 내릴까. 눈을 묘사한 음악은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드뷔시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코너’에 나오는 ‘눈송이는 춤춘다’나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1막의 ‘눈송이의 춤’은 흩날리는 눈발의 환상 속으로 듣는 사람을 데려간다.
올해 90세가 되는 에스토니아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의 ‘벤저민 브리튼을 기리는 칸투스’는 제목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쥘리에트 비노슈가 출연한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1991년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에 이 음악이 나온다. 다리 위에 눈발이 날리는 장면이다. 종소리와 현의 하강 음형만으로 이어지는 이 작품은 악보만 펼쳐 봐도 음표들이 비스듬히 아래로 향하는 모습부터 마치 눈발이 쏟아지는 듯하다.
오늘(7일)은 프랑스 작곡가 프랑시스 풀랑크(1899∼1963)의 126번째 생일이다. 이 풀랑크의 유일한 오르간협주곡을 들으면 마치 눈 위의 추격전 같은 느낌이 든다. 스키를 타고 펼치는 첩보 요원들의 숨 막히는 추격 장면이랄까.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3막에는 여주인공의 병 때문에 헤어져야 하게 된 두 연인이 안타까워하면서 ‘겨울에 헤어지는 것은 너무 외로운 일이니 봄까지 이별을 미루자’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온다. 과연 실연해도 좋은 계절이 따로 있을까. 봄이라면 화사한 주변과 대비해 자신이 너무 처량해질 것이고, 여름이라면 너무 답답하겠고, 가을이라면 너무 쓸쓸하겠고, 겨울이라면 ‘라보엠’ 주인공들의 말처럼 너무 적막하게 마음이 얼어붙을 것이다.푸치니보다 열두 살 위로 그와 친분을 나누었던 토스티의 가곡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에서 1인칭 화자는 ‘그대 마음은 얼음으로 되어 있으니’라고 탄식한다. ‘라보엠’에서 남주인공 로돌포 역으로 불멸의 녹음을 남겼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왕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번에는 러시아 민요로 가보자. 옛 공산권의 맹주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 땅은 ‘동토의 왕국’이라고 불렸다. 그 얼어붙은 찬 땅에 대한 공포는 얼마간 사라졌지만, 역시 겨울에는 러시아 노래가 제격이다. 오락실의 ‘테트리스’ 음악으로 사랑받았던 러시아 민요 ‘코로베이니키’(행상인)나 ‘칼린카’를 그야말로 동토를 쩡쩡 울리는 듯한 러시아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노래로 들어본다. 흐보로스톱스키는 안타깝게도 2017년 55세의 나이에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예전 ‘새해 결심을 하면서 들을 만한 음악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생상스 피아노협주곡 4번 2악장 2부의 시작 부분에서 새로운 결심을 위한 용기를 얻곤 했다. 마치 유장히 펼쳐지는 평원과 그 위에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지는 듯한 음악이다. 약간 느릿한 연주가 더 어울린다. 피아니스트 알도 치콜리니와 세르주 보도 지휘 파리 오케스트라가 협연한 음반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유윤종 문화전문기자 gustav@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week ago
7
1 week ago
7
![[사설]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72218.1.jpg)
![[횡설수설/정임수]‘54년 족쇄’ 벗는 기아 소하리 공장](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71632.2.jpg)
![[오늘과 내일/서영아]‘뇌 썩음’, 이겨낼 자신 있나요?](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72186.1.png)
![[동아시론/민정훈]美 이익이라면 못 할 게 없다는 트럼프 ‘돈로 독트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72182.1.jpg)
![[광화문에서/황형준]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 된 尹](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72177.1.jpg)
![[글로벌 이슈/하정민]‘서사’ 있는 극우가 온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5/130872337.1.jp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근처 갈 만한 커피숍 알려줘"…'이 번호' 누르자 챗GPT가 받았다 [송영찬의 실밸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395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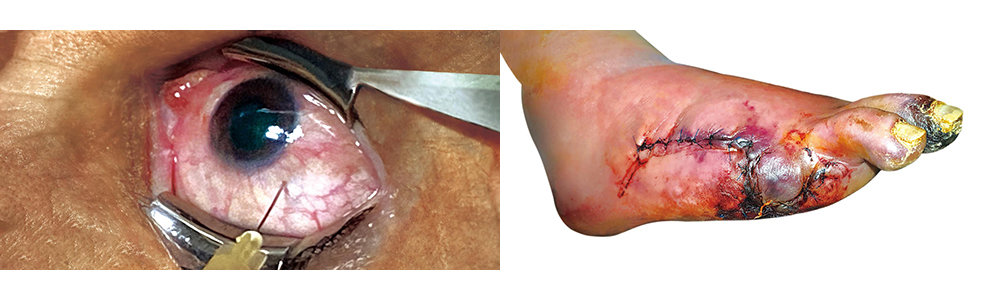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