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민사 주목한 새책 나와
자치기관 구성-농업 능력 등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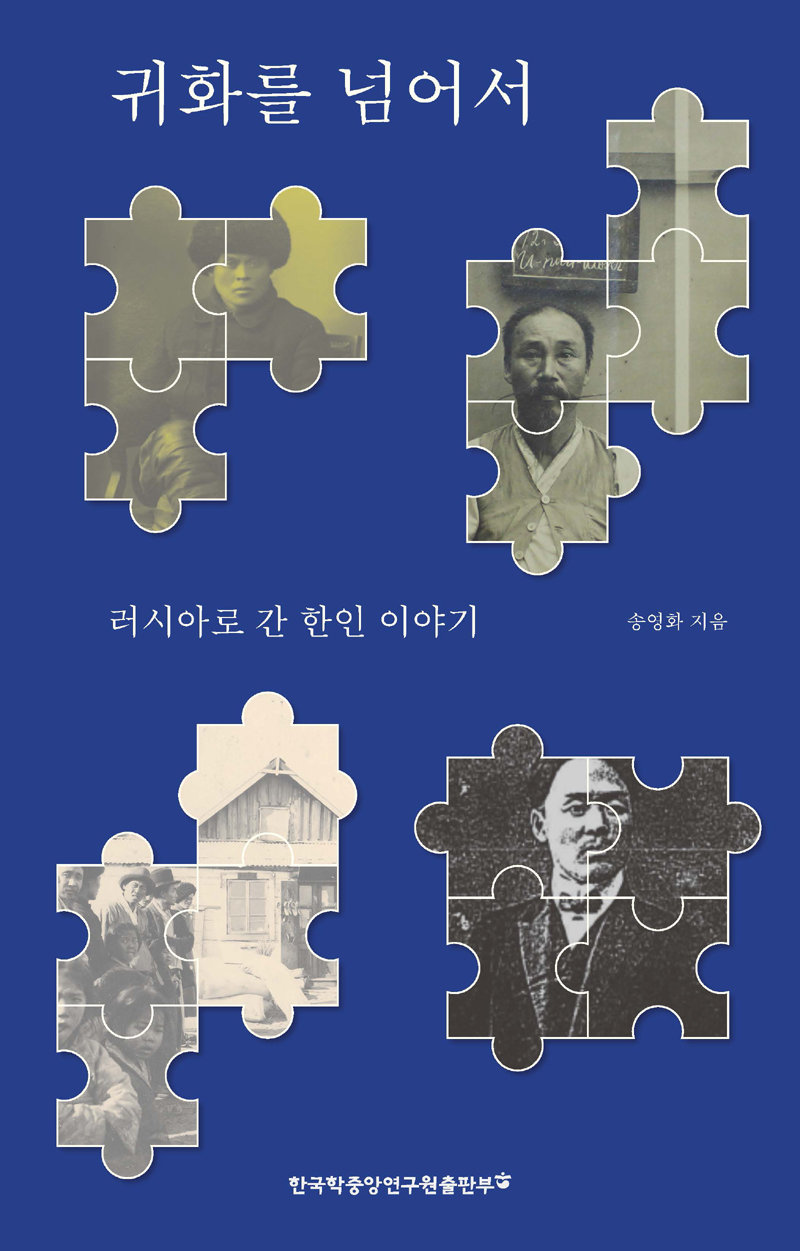
책에 따르면 개척리는 위생 문제를 우려한 러시아 당국이 늘어난 이민자를 격리하면서 형성된 ‘황인종 게토(ghetto)’였다. 1893년 당국은 한인에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외의 이 지구를 배정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와 개척리를 잇는 큰길이 ‘카레이스카야(한인) 거리’였다.
한인들은 자치기관인 한인거류민회를 구성하고 교육과 위생, 치안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한인 언론도 위생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청결한 행위로 러시아 당국의 신용을 얻고 자치를 허용받아야 고국 독립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척리는 1911년 당국에 의해 방역을 명목으로 결국 철거됐다. 저자는 “개척리 철거는 위생 논의에 기반했지만, 동시에 인종주의적 조치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자 한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은 신민화를 유도했다. 한인이 일본인이 되면 거주허가증 발급비가 85% 줄었다. 반면 러시아는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인에게 국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에 반감을 지녔던 한인 망명자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일본의 체포와 간섭을 피했다.
이주 한인들은 러시아에서도 뛰어난 농업 능력을 인정받았다. 러시아 외무성 관료 그라베는 한인이 “농작이 불가능한 땅이라 하더라도 잘 일궈 귀리 또는 메밀을 재배한다”고 기록했다. 아무르주의 한 농장에선 한인이 경작한 땅의 단위 수확량이 러시아인의 최대 5배였다고 한다. 한인들의 높은 농업 생산성이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킬 정도였다. 러시아는 한인의 러시아 동화 가능성을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한인들은 러시아인이 다니는 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저자는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은 고국의 식민화와 현지 적응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마주했다”며 “한반도 바깥에서 새롭게 탄생할 고국을 꿈꿨다”고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9 hours ago
1
19 hours ago
1
![[포토] 부키리치 '대 역전극을 보라'](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0421335185185_1.jpg/dims/optimize/)
![김재중, 회혼례 父 눈물에 울컥.."아버지 눈물 처음 봐"[편스토랑][별별TV]](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0420312583064_1.jpg/dims/optimize/)
!['송승기 꿈의 프로 첫 승+김현수 3안타' LG, KIA 8-2 꺾고 '기선 제압' [잠실 현장리뷰]](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0414220833827_1.jpg/dims/optimize/)
![[포토] 메가 '또 뚫었다'](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0421261996444_1.jpg/dims/optimize/)
![[포토] 메가 '연경, 수지 잘 만났어'](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0421243026077_1.jpg/dims/optimize/)
!['푸이그 만루포+하영민 부상 투혼 역투' 키움, 3연패 끊었다! NC 5-1 제압 [고척 현장리뷰]](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0414440188500_1.jpg/dims/optimize/)
![[포토] 부키리치 '가볍게 연타'](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0421230336175_1.jpg/dims/optimize/)
![[포토] 부키리치-정호영 '여제에 또 당했어'](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0421183419204_1.jpg/dims/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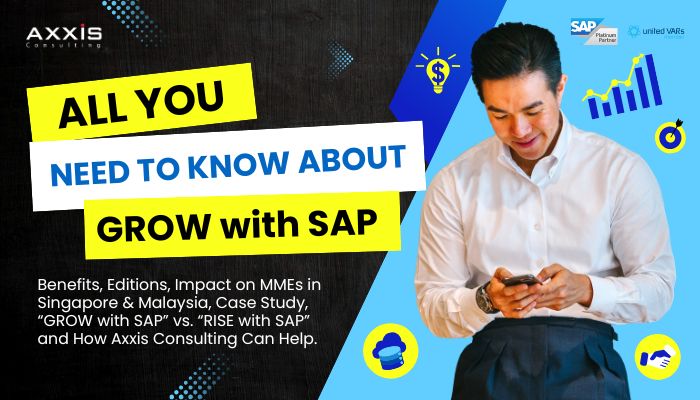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