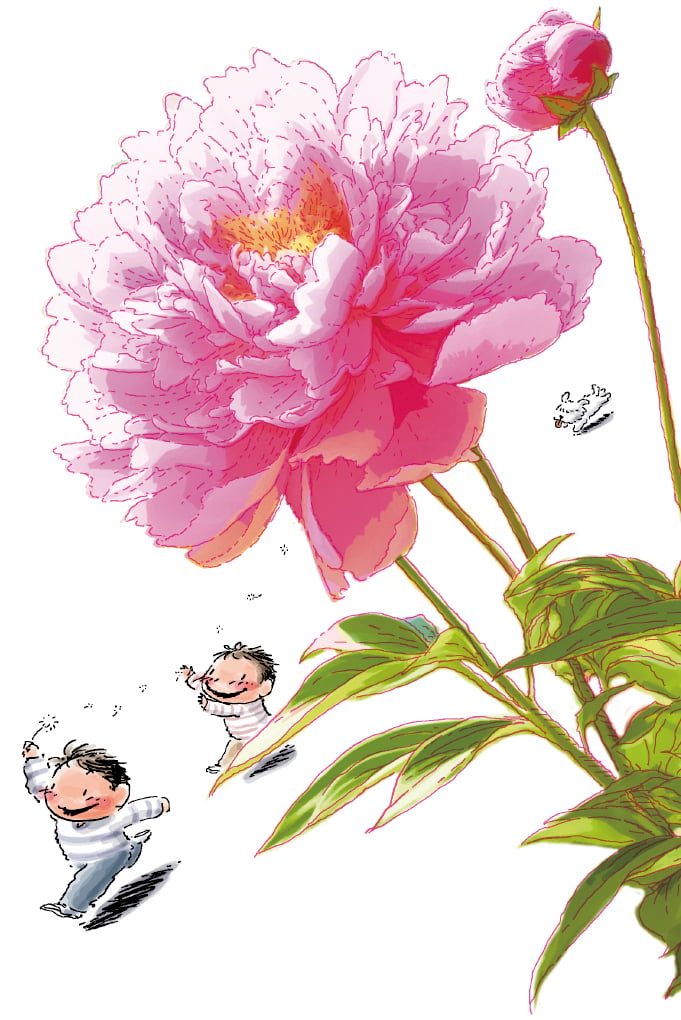
봄은 끝났다. 가는 봄은 곧 돌아올 봄이다. 앞으로 무심히 오는 봄날을 몇 번이나 더 맞을까 헤아려보다가 일순 정신이 아득해진다. 하얀 양파 뿌리 같은 봄비 며칠. 활엽수엔 새잎들 돋아 초록이 짙어지는데, 작약과 모란의 꽃망울이 생기는 계절은 이토록 풋풋한데 나는 어쩌자고 쓸쓸한가? 나는 아무런 꿈도 야망도 없이 술과 담배, 포커도 배우지 못한 채 고작 시나 쓰던 청년이었다. 어쩌다 김소월, 다자이 오사무, 에릭 사티 같은 자멸파 예술가에게 마음이 홀려 그들을 흠모하며 따랐을 뿐이다.
모란꽃 같은 첫사랑 꿈꿨지만
그 젊던 날엔 앞날이 안 보이고 현실은 팍팍했으니 살기에도 죽기에도 애매했다. 끝내 미치지도, 하룻밤 새 유명해지지도 않은 난 새벽에 헤르만 헤세나 알베르 카뮈의 번역 소설을 뒤적이다가 먼 데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먼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며 찾고 있을 듯했다. 모란꽃 같은 첫사랑을 갈망했지만 낯선 여자와 눈만 마주쳐도 화들짝 놀라는 숙맥이니 그건 애초에 불가능했다. 나는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다. 몸엔 살점이 없고 팔다리가 가는 청년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죽을 듯이 연모했던가? 몇 밤을 불면으로 새우며 얼굴은 창백했던가? 첫사랑의 꿈은 아득해지고, 나는 속물이 돼 아무 쓸모도 없는 나이만 자꾸 먹었다.
누군가를 연모했지만 제대로 된 연애는 없었다. 그렇게 세월을 축내며 혼자 우연과 모호함 속에 웅크린 채 엎드려 있었다. 누군가는 군대를 가고, 누군가는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절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먼 이국으로 훌쩍 유학을 떠났다. 나는 여중생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 중학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남는 시간엔 고전음악 감상실에서 니콜로 파가니니나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을 처음 영접했을 땐 큰 충격을 받았다. 자주 헌책방을 기웃거리거나 프랑스문화원에서 젊은 알랭 들롱이 나오지만 한국어 자막은 없는 프랑스 영화를 뜻도 모른 채 보았다.
내 마음 여린 데 박힌 시의 화살
고교 중퇴 뒤 양봉업을 배우거나 외항선을 타고 싶었지만 기술도, 노동을 감당할 만한 체력도 없었다. 빈둥거리며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었는데, 그때 읽은 책은 일본어 중역판이었다. 그랬건만 은유는 화사하고 사상은 바닥이 없는 심연인 듯 깊었다. 니체에게 흠뻑 빠졌던 시절은 마종기 시인의 연작시 ‘연가’를 줄줄 외우던 때이기도 했다. 봄날엔 누군가 귓가에 “죽은 친구는 조용히 찾아와/봄날의 물속에서/귓속말로 속살거리지,/죽고 사는 것은 물소리 같다”고 속삭이곤 했다.
“의학교에 다니던 5월에, 시체들이 즐비한 해부학 교실에서 밤샘을 한 어두운 새벽녘에, 나는 순진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네. 희미한 전구와 시체들 속살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인육(人肉) 묻은 가운을 입은 채. 그 일 년이 가시기 전에 시체는 부스러지고 사랑도 헤어져 나는 자라지도 않는 나이를 먹으면서 실내의 방황, 실내의 정적을 익히면서 걸었네. 홍차를 마시고 싶다던 앳된 환자는 다음 날엔 잘 녹은 소리가 되고 나는 멀리 서서도 생각할 것이 있었네.”(마종기, ‘연가 9’) 내겐 죽은 친구도 없었으니 죽은 친구가 귓속말을 하는 법도 없다. 하지만 내 마음 여린 데 박힌 시의 화살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한 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사서 가슴에 품고 돌아와 하루 네 시간씩 읽으며 엿새 만에 완독한다. 그때 니체는 나와 같은 스무 살이었다. 쇼펜하우어를 알고 난 뒤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누른 채 제 누이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우리는 무얼 찾고 있는 거지? 일상의 안위, 아니면 행복? 그게 아니야. 어쩌면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그릇된 진실 외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 내가 찾은 것은 일상의 안위도 행복도 인생의 진실도 첫사랑의 황홀경도 아니다. 그것은 잉여나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내 갈망은 작고 꿈은 소박했다. 겨우 책 몇 권, 고전음악, 혼자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이면 충분했다.
늘 새로운 봄을 맞는 것도 기적
모란꽃 흐드러진 그해 봄은 미치도록 아름다웠다. 어디에나 넘쳐나는 햇빛과 만개한 꽃들, 닝닝거리는 꿀벌들, 새의 명랑한 지저귐,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봄날. 어쩌자고 나만 빼고 이 세상이 다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가? 어린아이들이 까르륵대며 웃을 때 내가 처한 가난과 불행 따위는 너무나 하찮아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나는 아무나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싶었다. 죄송해요, 이렇게 사는 건 다 제 불찰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다. 아, 세상은 아름다워라,라는 찬탄의 말이 저절로 나온다. 노트 한 귀퉁이에 몰래 적어놓은 “삶은 아름답다, 그것 말고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는 구절은 카뮈의 것이던가?
모란꽃 피어 찬란할 때 미칠 만큼 살고 싶었다. 삶을 갈망할수록 속이 헛헛하고 기분이 쓸쓸한 건 무슨 까닭일까? 스무 살의 봄날에 내가 찾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루 네 시간만 잘 것, 등단 전 시 200편을 습작할 것, 성문영문법과 더불어 하루 영어단어 50개를 달달 외울 것, 가짜와 상투성에 맞서 싸울 것, 고통으로 영혼을 단련할 것, 불행에 겁먹지 말 것 등이 내가 품은 금과옥조들이다.
스무 살의 봄, 내 꿈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 시골 구석에서 모란과 작약을 심고 아내와 어린 딸을 건사하는 것, 내겐 그 이상의 어떤 야망도 없었다. 스무 살 이후 내가 살아 있는 건 기적이다. 늘 새로운 봄을 맞는 것도 기적이다. 물풀처럼 한가롭게 흐느적이는 사이 늦봄은 저물고 천천히 사라지는 중이다.

 10 hours ago
1
10 hours ago
1
![[MT시평]주민자치 실질화하는 개헌해야](http://thumb.mt.co.kr/21/2025/04/2025042716402051327_1.jpg)
![[투데이 窓]협상의 기술은 이론전 아니라 심리전이다](http://thumb.mt.co.kr/21/2025/04/2025042816084878531_1.jpg)
![[사설]국힘 후보 金-韓 압축… 집권 청사진은 언제 내놓을 건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29/131520209.1.jpg)
![[김승련 칼럼]대통령 최측근들의 집단적 ‘불고지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29/131520192.1.jpg)
![[횡설수설/신광영]‘블랙 아웃’… 19세기로 돌아간 스페인-포르투갈](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29/131520183.1.jpg)
![[오늘과 내일/장원재]‘혐중 시위’ 막을 ‘카운터 시위’가 필요하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29/13152017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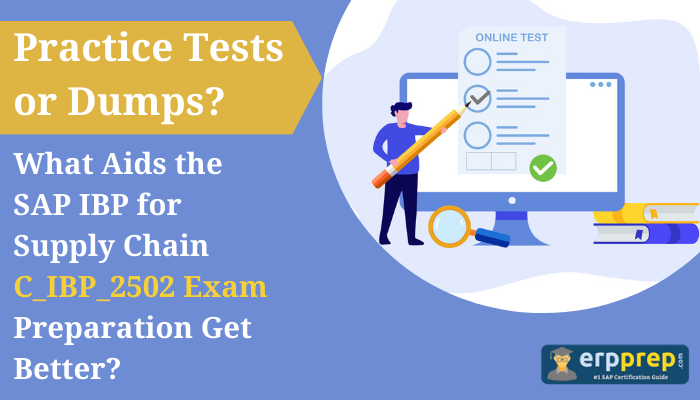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