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애플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 오름세가 특히 컸다. 미국 국챗값 폭락(금리 급등)과 함께 나타났던 달러화 급락세도 진정세를 보였다. 시장의 반응은 관세전쟁 이전으로 회귀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관세율을 115%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합리적 판단이다. 애당초 양국이 관세를 145%(미국), 125%(중국)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 경제전쟁이었다. 협상 이틀 만에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철회할 정도로 속전속결로 문제를 푼 것이 다행스럽다. 강력한 관세 포문을 쉽게 열었지만, 양국 모두에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찮게 전개됐다. 미국에서는 수입품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달러화 약세가 경제를 힘들게 했다. 제조업 기반의 중국 경제 역시 수출길이 막힌다는 우려로 비상등이 켜졌다. 어디서나 일자리 축소는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양국 모두 잘 알 것이다.
이제라도 양국이 개방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돌아서야 한다. 하지만 아직 낙관도, 성급한 기대도 이르다. 미국이 유지하겠다는 30% 관세도 트럼프 집권 이전에는 없던 것이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관세전쟁은 90일 유예일 뿐이다. 트럼프 정부는 또 ‘약값 최대 80% 인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예고하는 등 세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조치를 더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전쟁의 불씨는 그대로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한국의 대미 수출 흑자가 지난해 556억달러에 달한 점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쟁점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25%의 대(對)한국 관세 정책만으로도 지난달 대미 수출이 석 달 만에 감소(-6.8%)로 돌아선 데 이어 이달에는 30.4% 감소로 더 커졌다. 대미 10대 수출국 중 지난 1분기에 수출이 줄어든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점이다. 관세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얘기다. 미·중 간 타결은 잠시 숨고르기일 뿐 한국의 다면성 난제는 그대로다. 관세전쟁이 주춤해진 듯해도 갈 길은 아직 멀다.

 4 hours ago
2
4 hour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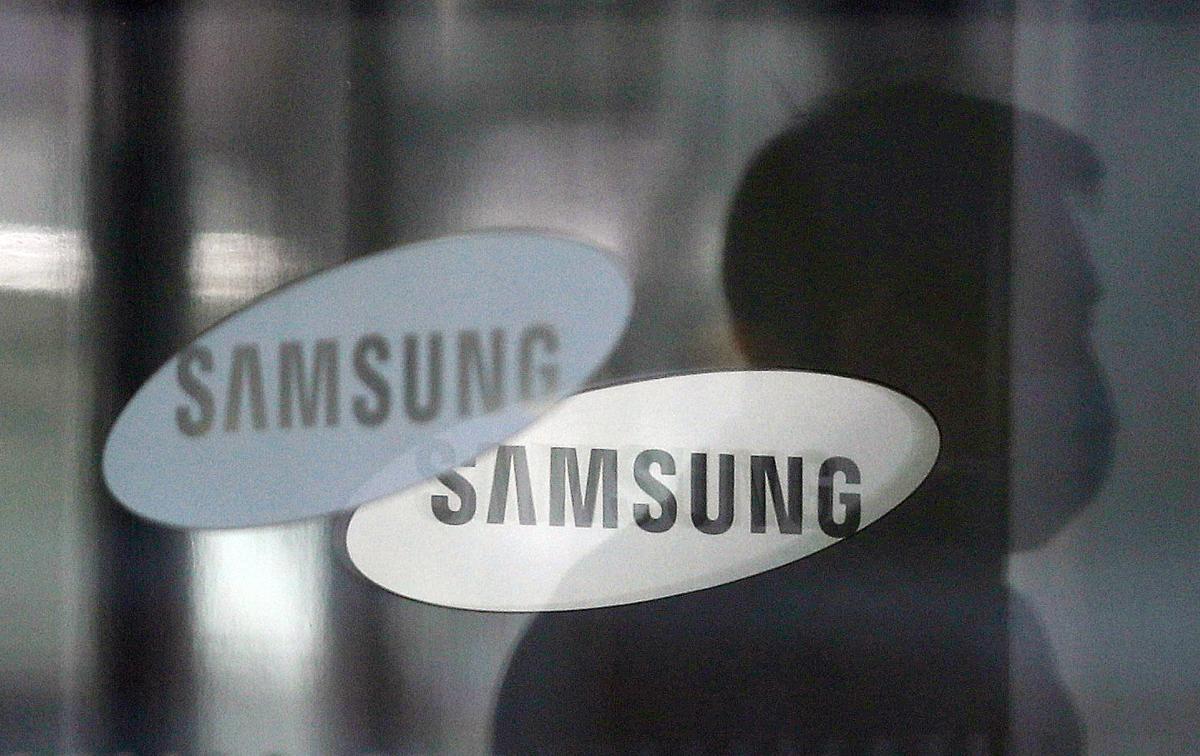




![[속보] 삼성전자,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독일 플랙트 2조3000억원에 인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2.22579247.1.jpg)

![[속보] 4월 취업자 19만4천명↑…제조업 6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https://pimg.mk.co.kr/news/cms/202505/14/news-p.v1.20250514.9f13d807008142b185071bb6bc068841_R.jpg)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