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의 시각] 정년연장론의 불편한 진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21748326.1.jpg)
지난달 21일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79%)이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답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열흘 남짓, 더불어민주당은 이름도 거창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오는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흐름이지 않은가. 그렇다. 정년 60세 연장을 추진한 2012년의 복사판이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 그해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직장인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이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고, 노동계의 ‘주문’ 대로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공교롭게도 법 통과 직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년 연장 찬성’ 비율은 77%였다.
정년 65세, 상위 10%에만 해당
정년 연장 논의가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민주당의 공언대로 연내에 정년 65세 연장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의 바람처럼 정년이 늘어나 모두가 안정적으로 65세까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뿐더러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013년 정년 60세 도입에 즈음해 기업들은 선제 조치에 나섰다. 임금체계 개편이 동반되지 않고 정년만 늘려놨기에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위로금을 쥐여줘서라도 권고사직 등 각자도생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정년퇴직자는 10년 전에 비해 28만5000명 늘었지만 정년 전 조기퇴직자는 57만 명 증가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5월 기준 만 55~59세 직장인 421만 명 중 232만8000명(55.3%)이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를 떠났다. 특히 명예퇴직·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난, 아니 정확히는 밀려나고 쫓겨난 임금 근로자가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55만4000명이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사정은 또 어떤가. 2016~2024년 55~59세 임금근로자가 약 8만 명 늘어나는 동안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거론할 것도 없이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는 물론 노동시장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부작용 줄일 해법부터 고민해야
물론 정년 연장 덕을 본 직장인도 있다. 문제는 이 혜택은 오롯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노동시장 최상단에 있는 상위 10% 근로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사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계속고용을 화두로 삼은 것은 상위 10% 근로자들의 퇴직 후 고용 및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억대 연봉을 받는 ‘월급루팡’은 늘었고, 기업들은 늘어나는 인건비에 청년 채용 문을 걸어 잠갔으며,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중소제조업 현장은 청년들의 외면 속에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다. 그렇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공고해졌다. 2013년 선거판에 휩쓸려 졸속으로 정년만 늘려놓은 결과다. 지금은 막무가내 정년 65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마주할 때다

 2 days ago
8
2 days ago
8
![[부음] 안동범(前 전자신문 이사)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전문기자칼럼] ''여행''은 외교적 자산이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광화문]"역사는 반복된다" 또 야만의 시대](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09002554563_1.jpg)
![[기고]지급결제의 혁신, 스테이블 코인](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06053928075_1.jpg)
![[우보세]선거 재테크](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505760212_1.jpg)
![[기자수첩] 정년연장, 선택이 아닌 필수](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407412534340_1.jpg)
![[MT시평]4년 중임제, 주의할 점](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340233047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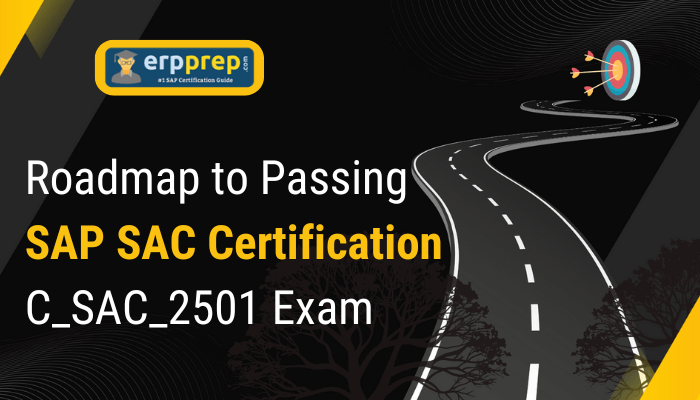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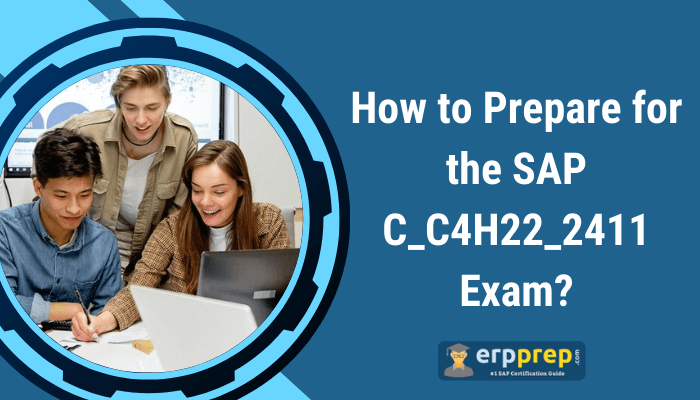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