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해 “환경을 내세운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을 방어한다면, 유럽은 순환경제 전환을 명분으로 한 환경 규제를 통해 또 다른 보호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EU 의회가 권고 지침이던 PPWR을 강행 규정으로 격상한 표면적인 이유는 폐기물 감축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EU는 “2009~2020년 포장 폐기물이 국민총소득(GNI)보다 더 빠르게 늘었고 전체 플라스틱 사용의 40%, 도시고형폐기물(MSW)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포장재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사용·재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아 저탄소 순환경제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모든 기업에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포장재 재사용 실적을 매년 각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PPWR이 기후·환경을 명분으로 한 일종의 보호무역 장벽이라고 말한다. 재생원료 최소 함량 인증, 라벨링, 유해 화학물질 검증 등 까다로운 요건이 역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역내 기업에는 상대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는 상황에서 PPWR 같은 환경 규제는 사실상 각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EU에서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같은 맥락이다. 철강 등 6개 품목의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이 제도는 무역 규제를 탄소·환경과 결합한 대표 사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인용해 EU 무역 규제의 핵심으로 탄소·환경을 꼽았다.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7월 발표한 무역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회원국이 도입한 신규 무역 제한 조치가 세계 상품 교역의 19.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WTO는 “이는 전년 동기(9%)의 두 배 이상으로 상당수가 환경·안보를 이유로 한 비관세 장벽이었다”며 “세계 교역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2 days ago
3
2 days ag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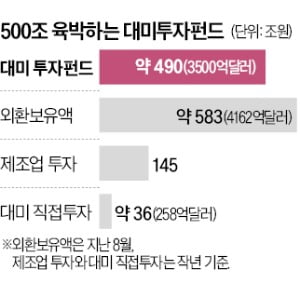
![[단독] 국민연금의 힘…'공실 우려' 마곡 원그로브몰 1년 만에 '완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AA.41798462.1.jpg)

![[단독] '불장'에 국민연금 올 수익률 벌써 11% 돌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AA.41798461.1.jpg)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