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예지. (쿠팡플레이 제공)
이수근부터 서예지까지, ‘SNL’은 어떻게 복귀 무대가 되었나
셀프 디스는 용서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예능은 그들을 씻어주지 않는다, 다만 대화의 문을 열 뿐이다
4월 12일, 배우 서예지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7’의 호스트로 등장했다. 오프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SNL 크루들을 다 가스라이팅해서 재미있게 해보겠다.”
2021년 김정현 가스라이팅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그가, 자신의 최대 논란을 첫 마디로 꺼낸 것이다.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밈으로 떠돌던 ‘김딱딱씨’라는 표현을 코미디 소재로 활용했고, 스스로를 AI로 설정한 ‘서예GPT’ 코너에서는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라는 대사로 은유적인 심경 고백을 남겼다.
이날의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연예인들이 대중의 정서 속에서 복귀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 ‘셀프 디스’와 ‘예능’이라는 리허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코드를 읽을 수 있었다.
서예지의 사례는 예외적이지 않다. 이수근 역시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뒤, 2015년 ‘SNL코리아 시즌6’에 출연하며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는 방송 중 “계속 감사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시청자들은 그의 복귀를 받아들였다.
2016년에는 그룹 쥬얼리 출신의 예원이 이태임과의 갈등 논란 이후 ‘SNL코리아’에 출연해 복귀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코미디 코너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대중으로 하여금 기억을 다시 쓰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SNL’은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스타들의 복귀 무대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논란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무겁게 처리하지 않고 풍자와 과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소하는 포맷 덕일 것이다. 대중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변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답을 유예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코미디가 지닌 강력한 힘이다.
SNL코리아는 미국 NBC의 전통 코미디쇼 ‘Saturday Night Live’의 한국판으로, 미국에서도 린제이 로한, 찰리 쉰, 트레이시 모건 등 여러 문제가 있던 스타들이 자신을 희화화하며 복귀의 실마리를 찾은 전례가 있다. 한국판 SNL이 이 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연예인은 논란을 피해가는 대신, 그 중심에 자신을 놓는다. 그리고 웃음을 매개로 다시 관객과 대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첫째, 논란의 성격에 따라 코미디적 전환이 가능한 범위가 결정된다. 개인적인 실수나 일시적인 구설이라면 풍자가 통할 수 있지만,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는 오히려 반감이 증폭될 수 있다.
둘째, 복귀는 ‘웃겼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일시적 환호는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도덕적 신뢰 회복은 별개의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가 갖는 ‘사회적 중재 기능’은 의미가 있다. 정면돌파도, 침묵도 어려운 시점에서 셀프 디스는 그나마 시도해볼 만한 소통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부끄럽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웃음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능은 용서를 대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문을 열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 서예지가 SNL에서 보여준 것은 설명이 아닌 질문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달라졌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자는 오직 대중뿐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1 day ago
2
1 day ago
2
![더보이즈 선우, 인성 논란 사과 “언행+불찰 반성, 증명해 나갈 것” (전문)[종합]](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5/04/15/13141523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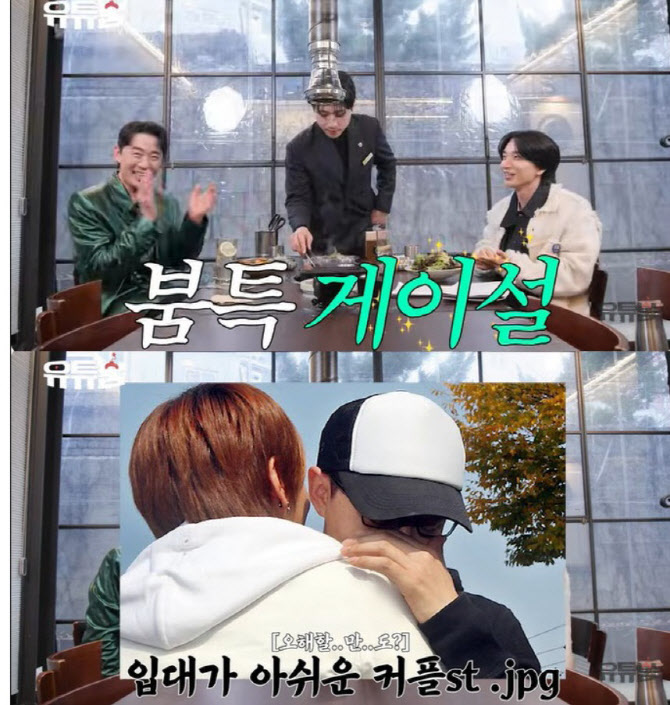




![차지연♥윤태온, 아침부터 주부 태업 갈등..눈물 쏟았다[동상이몽2][★밤TView]](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1422164395453_1.jpg/dims/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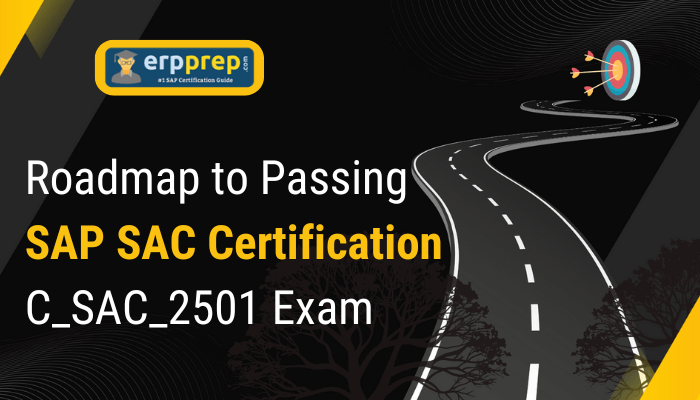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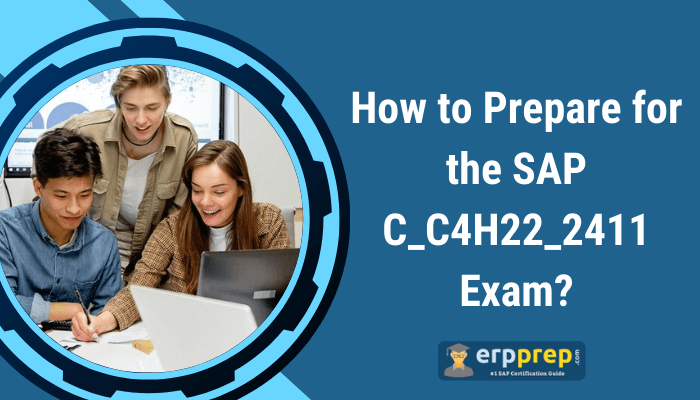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