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체력 바닥인데 '과잉 유동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7.15214330.1.jpg)
코스피 4000 시대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60% 넘게 뛰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간판 기업들의 실적과 불확실성에 휩싸인 대내외 여건이 그대로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시장에선 벌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옛말이 됐다는 환호가 터져 나온다.
주가뿐만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랠리를 거듭하다가 정부가 ‘부동산 계엄령’을 내리고서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안전자산인 금과 대표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가격도 올 들어 각각 50%, 20% 이상 함께 급등하는 기현상은 ‘노멀’이 됐다. ‘에브리싱 랠리’ ‘탈(脫)화폐 거래’ 등의 분석이 쏟아진다.
자산 랠리, 마냥 달갑지 않은 이유
자산 랠리는 한국에서 유독 더 낯설다. 솔직히 말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리 실물경제를 둘러싼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기초 체력은 지금 바닥나고 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 내외였지만 2010년대 들어 3%대로 하락한 이후 2020년대엔 2%대를 맴돌았다. 올 들어선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에서 2030년 1%대 초반까지 지속 하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한국개발연구원)마저 나온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더딘 노동·연금·교육 관련 구조개혁이 맞물린 결과다.
더 갑갑한 건 간판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다. 지난 10년간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조선 등 국내 8대 주력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규제 강화, 성장 둔화 등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한 데다 ‘레드 테크’(중국의 최첨단 기술)의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된 탓이다. 석유화학과 철강 관련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 없인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때리면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무너져내리는 속도가 잠시 늦춰졌는데도 그렇다.
상승세에 가려진 고름 짜내야
경제 체력은 떨어졌는데 시중에 풀린 돈은 넘쳐난다. 5년 전 2500조원 수준이던 M2(광의통화)는 올 들어 4400조원 수준(8월 기준)으로 불어났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정책금융 확대 등을 거치며 나타난 후유증 때문이다. 문제는 이 돈이 기업의 공장과 연구소, 상품 판매 및 유통, 소비 등에 스며들지 못하고 주식과 부동산, 코인 등에만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며 안절부절못하는 이유다. ‘과잉 유동성’은 미·중 패권 경쟁,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에 한국 경제가 더 취약해지는 아픈 고리가 됐다. 걱정이 유달리 많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한국 경제 상황을 이렇게 빗댄다. “폭약을 안고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다.”
당국자와 정치인들은 코스피 4000 시대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 랠리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오늘 고름을 도려내지 않으면 내일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 어쩌면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다.

 1 day ago
3
1 day ago
3
![[인사]LX홀딩스](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한경에세이] 생각보다 가깝고 오래된 친구](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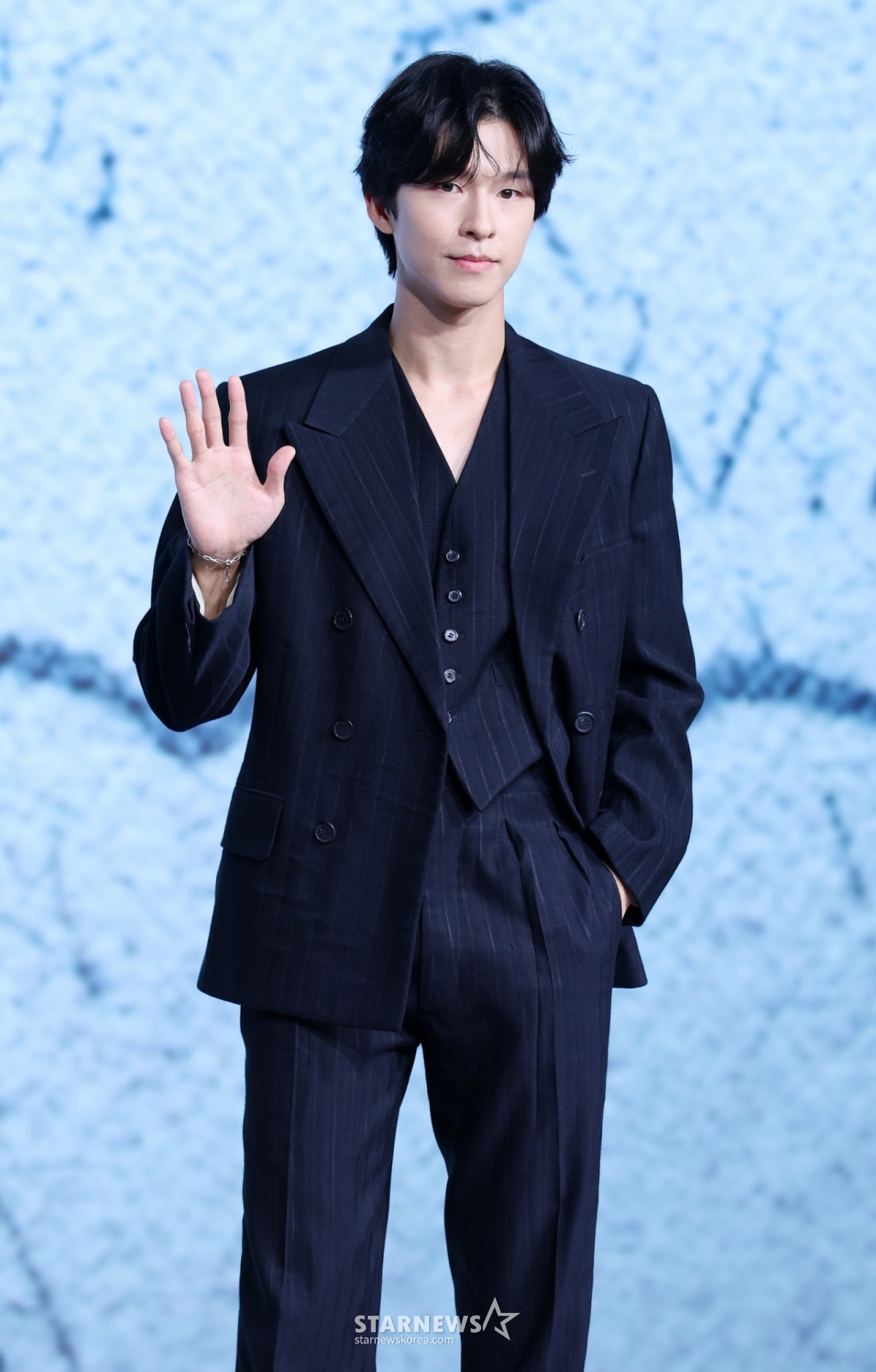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