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력 부족 문제, 인도가 답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40144195.1.jpg)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시행 첫해 2만5000명에서 2024년 16만5000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것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제조업, 어업 등은 물론 최근 음식점 주방보조 등에 이르기까지 많이 늘어났다.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가도 17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4개국은 송출국에 포함됐는데, 이들의 중심이자 모태 국가라 할 수 있는 인도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인도는 중국을 넘어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인력 송출국가다. 전 세계 인력 공급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만 900만 명이 넘은 인도인이 진출해 일하고 있다. 중동에 진출한 한국 건설회사들도 이들 인도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인재를 양성하는 인도공과대(IIT) 학생들은 졸업 전부터 입도선매돼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용접공만 해도 90만 명에 달하고, 우리나라 E-7 전문직 비자 요건인 대학 졸업 자격을 갖춘 전기공, 플랜트공 등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중동 등 해외 근무 경험이 있고 영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인도의 30개 주 가운데 동북부에 있는 미조람 등 8개 주 주민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몽골리안 인종이다. 대부분 기독교인이며 영어가 유창하고 학력 수준이 높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국내 조선업, 건설업 등의 업종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등에도 인도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질서에 동행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국가다. 세계 최대인 14억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5위 경제 대국이다.
2023년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인도를 미지의 나라, 먼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 양국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는 국가 중점 사업인 인력송출 확대를 돕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 한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 시 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세 등 각종 조세 감면, 비관세 장벽, 한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days ago
9
2 days ago
9
![[부음] 안동범(前 전자신문 이사)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전문기자칼럼] ''여행''은 외교적 자산이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광화문]"역사는 반복된다" 또 야만의 시대](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09002554563_1.jpg)
![[기고]지급결제의 혁신, 스테이블 코인](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06053928075_1.jpg)
![[우보세]선거 재테크](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505760212_1.jpg)
![[기자수첩] 정년연장, 선택이 아닌 필수](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407412534340_1.jpg)
![[MT시평]4년 중임제, 주의할 점](http://thumb.mt.co.kr/21/2025/04/2025041513340233047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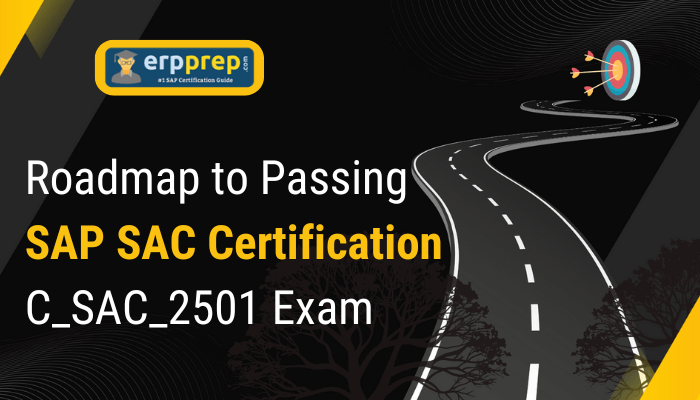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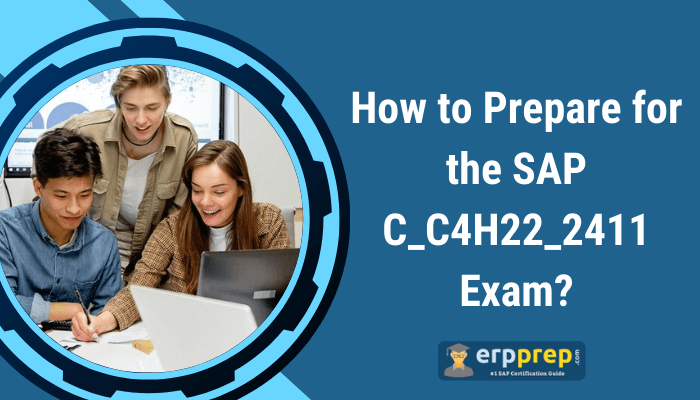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